- 2023. 04. 08

영화라는 꿈을 꾼 적이 있는 사람에게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영화일 것이다. 특히 영화가 이젠 과거의 꿈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영화의 내용은 심플하다. 일이 끊긴 영화 피디가 어쩔 수 없이 일을 쉬면서 다시 초심을 되찾아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 이야기. 요약을 하면 단순하지만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저 문장대로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것이다. 나도 작년에는 자발적 백수를 자처하며 나만의 시간을 가져 보았지만 시나리오는 제대로 쓰지 못했다.
나도 이젠 점점 영화가 과거의 꿈이 되어가고 있다. 영화과를 졸업하고 나서 세 작품 정도 현장 스태프를 해본 것이(그 마저도 딱히 내가 원하는 파트는 아니었다) 나의 영화인 경력의 전부다. 현장 스태프를 겪어보고 나서는 회의감이 들었다. 이대로 몇년 더 하다가는 나이만 먹고 시나리오도 못 쓰는 건 아닐까? 현장을 가보면 의외로 이거 그만하고 시나리오 쓰고 싶다고 말하는 스태프들을 종종 만나곤 한다. 저마다 마음 속에 품은 이야기 하나씩은 있겠지. 그 이야기가 기승전결을 갖춘 한 편의 글이 되기까지는 꽤 어렵고 힘든 과정과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걸 쓰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나는 90년대 영화광이 아닌데도 그때의 문화에 끌려서 지금도 영화잡지 키노를 중고로 구해서 보고. 정은임의 영화음악을 가끔 찾아 듣는다. (감사하게도 팟캐스트에 당시 녹음본이 업로드 되어있다!) 그 당시의 나는 어린 꼬마였으므로, 아는 거라곤 둘리의 지구별 대모험, 라이온 킹 등의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보고 또 보는 것만이 내가 영화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내가 성인이 된 때에는 영화를 사랑하는 방식은 그때와는 조금 달라졌다. 90년대식처럼 애틋하게 영화를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방식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실시간으로 그때 그때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고 과거의 영화들도 쉽게 구해 볼 수 있고, 영화에 대한 소식은 넘쳐 난다. 영화가 꿈과 이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민망한 구석도 있다.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지는 물성보다는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해서 보는 파일로 존재하는 지금의 영화는 '컨텐츠'라는 덩어리에 가까우니까.
물론 요즘에도 극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때 그 시간이 아니면 볼 수 없다는 제한이 없다. 각자의 sns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영화를 봤다는 인증을 하거나 영화의 장면 이미지를 인용해서 글을 쓴다. 모여서 이야기하거나 어떤 평론가의 글이 발행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 편이 더 쉽고 편리하다. 모두가 어쩌면 평론가처럼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솔직히 요즘의 방식보다는 과거의 방식에 마음이 끌린다. 지금과는 생소한 문화라 그저 단순한 호기심일 수는 있지만 그 당시의 순수한 마음들,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과 고전에 대한 경외심, 열광적인 분위기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조금은 순수해지는 기분이 든다. 찬실이도 그때 그 시절, 키노를 구독하고 매일 밤 정은임 DJ를 기다렸을 영화 청년이었겠지. 그 뜨겁고 순수한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었던 20대의 찬실이가 부러웠다. 90년대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가 만들어내는 이상한 신비로움이 일부러 키노와 정은임의 라디오를 찾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 관객 각자의 '영화'를 시작해보고 싶게 한다. 아마 누군가는 이 영화를 보고나서 덮어놓았던 노트북을 켜 시나리오 한 페이지를 쓰고 싶어지거나 책장 한 구석에 모아둔 먼지 쌓인 영화 잡지들을 다시금 펼쳐 볼지도 모른다. 내가 왜 영화를 사랑하기 시작했는지, 지금의 나에게 영화는 무엇인지, 영화와 삶의 관계는 무엇인지 머릿 속에서 질문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이제는 우리 곁에 너무나 흔하게 존재하는 ‘영화’라는 것이 그저 그런 오락과 심심풀이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의미, 꿈과 사랑을 일깨워주었던 존재라는 걸 새삼 느꼈다. 나도 다시 용기와 힘을 내어 조금씩이라도 영화를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보려고 한다. 어두운 방 안에 노트북을 켜놓고 들리는 것이라곤 키보드 소리 뿐인, 나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들에 집중하는 그 시간. 어쩌면 그 무엇보다도 그 시간이 필요했다.
2. 2025. 12. 22
2023년부터 지금까지, 약 2년동안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계속 무언가를 쓰려 애쓰지만 잘 되진 않고 중간 중간 알바를 해가며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언가를 쓰고 있을 뿐. 작년에 한 번, 에세이가 지원작에 선정되어 100만원을 받은 것이 유일한 성과였다. 힘든 줄은 알았지만 한 해가 갈수록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졌다.
그래도 스스로를 칭찬해본다면, 계속해서 나만이 쓸 수 있는 글, 쓰고 싶은 글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영화에 대한 애정과 계속 글을 쓰겠다는 의지로 1인 출판사와 에세이 메일링을 시작한 것. 당장의 어떤 결과를 바라기만 했다면 결코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빨리 뭔가를 이루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 찬실이 슬프고 웃기고 외롭고 속상한 나날을 지나 비로소 시나리오의 한 줄을 쓸 수 있던 것처럼 나는 그저 쓸 뿐이다. 그 모든 날들을 통과해 쌓인 마음으로.
"나는 오늘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 대신 애써서 해."
<찬실이는 복도 많지>에서 할머니 역으로 나왔던 윤여정의 대사다. 2026년, 아니면 그 후로도 쭉 이 대사를 삶의 모토로 삼으려 한다. 하고 싶은 일을 애써서 하는 것만큼 주어진 삶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 저 대사를 가만 가만 읊으면 당장 먼 미래는 알 수 없어도 당장 내일은 좀 살 만할 것 같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 지나고 쌓여서 일 년이 지나면 나는 어디에 닿아 있을까. 흘러가듯 사는 것 외엔 다른 방법도 결말도 떠오르지 않는다. 어디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일까 두려울 때마다 저 대사를 기억해야겠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보라며 따뜻하고 진심어린 응원을 건네는 이 영화가 참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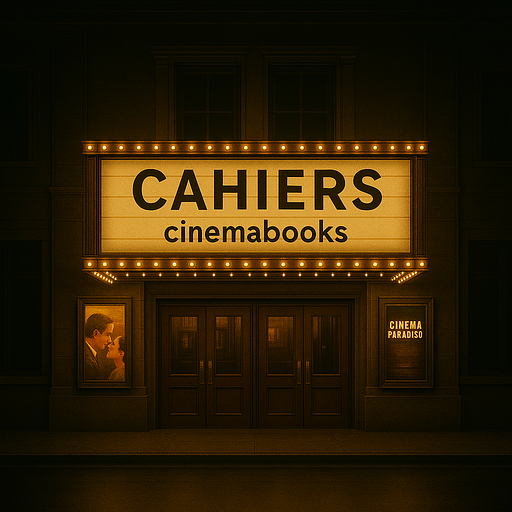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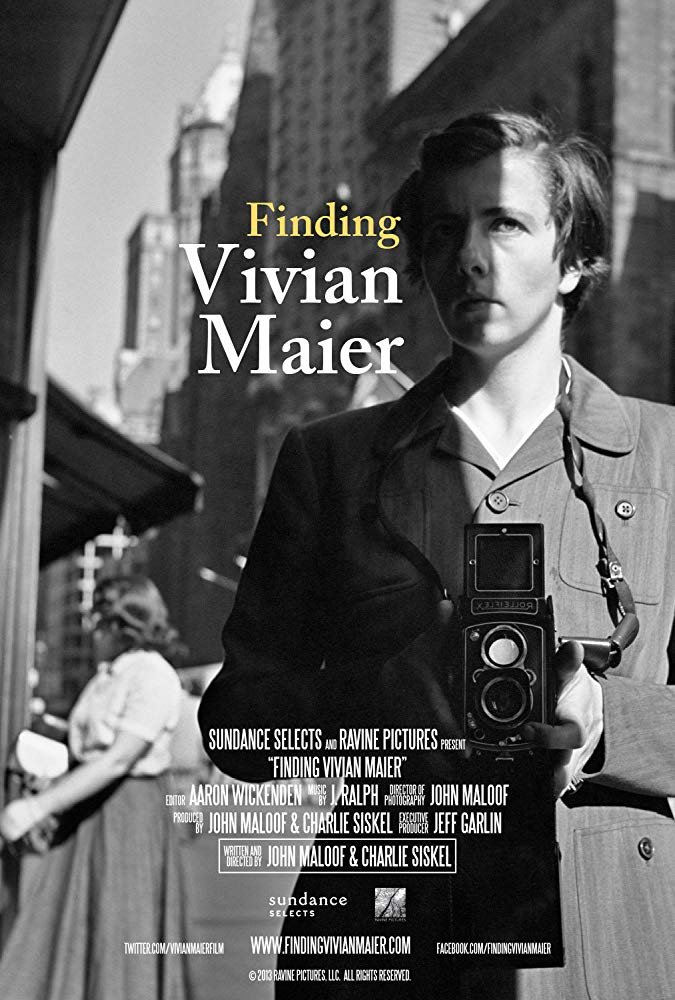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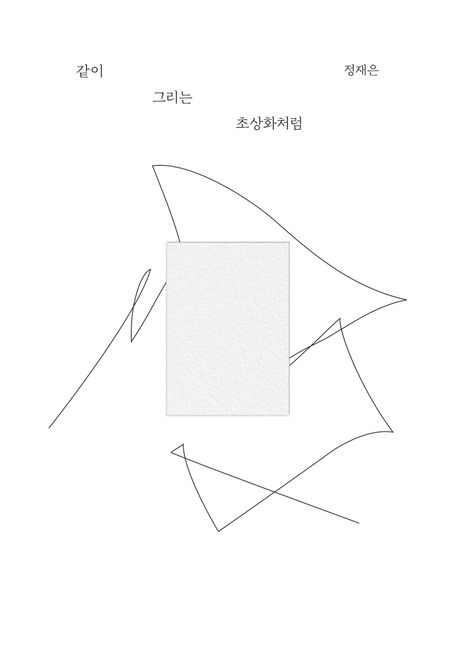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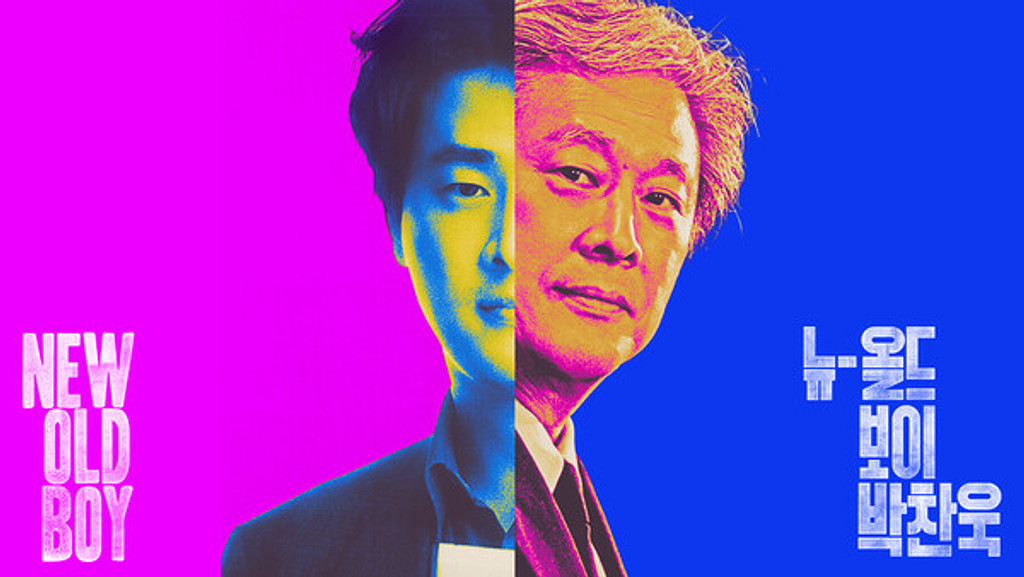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워니
🫰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