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나날>을 두 번 보았다. 처음 본 것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두 번째는 정식 개봉을 한 이후 토요일 낮 명필름 아트센터에서. 영화를 아직 보지 않은 남편의 감상도 궁금해서 함께 또 보았다.
영화는 참 심플하다. 종이에 한 글자 한 글자 연필로 'S#1'부터 새겨 쓰는 각본가 '이'(심은경)를 비추며 시작하는 영화는 그녀가 써내려가는 장면처럼 차분하고 심심하다. 초반은 여름을 배경으로 한 '이'의 영화다. 부유하는 젊은 여행자들의 나른한 이야기. 마치 이 이야기는 '이'의 현재 심경을 반영한 듯하다. 고독하고,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르겠고, 폭우 속에서 험난한 파도에 그냥 몸을 맡겨버린다.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어떤 감정들. 한 대학에서 진행되는 상영회와 GV에서 '이'는 고백한다.
"저에게는 재능이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는 어두컴컴한 방에서 글을 쓰려해보지만 이내 노트북을 덮는다. 그 장면 위로 흐르는 나레이션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다. 설명되지 않았던 감정들이 스크린 위에 그려지는 순간. '말'에 붙들려 어떤 것도 쓰지 못할 것만 같은 막막함에 나는 자주 사로잡힌다. 처음 보았을 때 이 장면의 잔상이 오래 남아, 나도 한달 후 도쿄로 잠시 떠나기도 했다.

우리는 정말로 수많은 '말'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조차 스마트폰을 켜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의 '말'이 쏟아진다. 두 번째로 <여행과 나날>을 보았을 때 깨달은 것은, 놀라울 정도로 스마트폰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 흔한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조차, 심지어 전화가 오는 장면조차 없다. 이는 노트북 보단 종이에 직접 글을 쓰고, 휴대폰 카메라가 아닌 선물받은 교수의 유품인 필름 카메라로 풍경을 담는다. 심지어 여행지에서 조차 예약을 하지 않고, 숙소를 물색할 때도 호텔 직원이 그린 약도를 참고한다. 이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디지털 디톡스'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찾은 민박집 마저 마치 오래된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 듯, 낡고 오래된 시골집이다. 티비는 당연히 없고, 방 한 가운데 땔감을 떼서 난방을 하고 비단잉어를 한 마리를 잡으려면 옆마을까지 눈발을 헤치고 가야하는 곳. 흩날리는 눈이 스치는 소리까지 선명히 들릴만큼 조용한 곳. 이는 민박집 주인과 어색하지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민박집을 채우고 있는 누군가의 흔적같은. 그 흔적으로 주인 아저씨의 쓸쓸한 하루를 짐작케 한다. 민박집을 떠나는 날, 홀로 남은 '이'는 그 공간을 다시 한 번 둘러본다. 잠시였지만 그 곳에서 사는 주인 아저씨의 삶이 스며든 곳은 단순한 민박집이 아닌, 이야기가새겨진 곳이 된다.
스펙터클한 사건은 커녕 뚜렷한 갈등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 영화를 떠올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움직인다. 어쩌면 철저한 판타지일지도 모르겠다. 앱으로 예약하지 않고 설원 깊숙한 곳에서 안온하게 하루를 보내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어쩌면 저런 여행을 꿈꾸는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놓고 자연 속에서 소란스러웠던 마음을 비우고, 그 빈 공간을 다시 좋은 것들로 채우고 돌아오는 여행. 이야기와 말 속에 갇혀 쉬이 떠오르지 않는 이야기와 씨름했던 '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작지만 의외의 모험, 타인의 삶 속에 잠시 들어가는 경험이었다. 슬프지만 이런 경험을 자주할 순 없다. 너무나 바쁘고 여유가 없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겐 '이'의 여행과 닮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바로 영화관이다. 영화를 볼 때, 우리는 타인의 삶 속에 잠시 초대된 여행자가 된다. 미야케 쇼는 최대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정교한 사운드, 온도가 느껴질만큼 생생한 영상으로 이 여행을 담아 우리에게 보여준다. 여행은, 영화는 그래서 꼭 필요하다. 잠시 나의 일상은 완전히 접어두고 잊어버린 채, 또 다른 누군가의 일상에 나의 시간을 포개어 보는 것. 그런 경험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그래야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
아직 완전히 나아지진 않았지만, 요즘 나는 글이 잘 써지지 않았다. 글을 쓰는 일이 왠지 모르게 다시 두려워졌기 때문이다. 뭔가 나는 아무것도 가치있는 것을 생산해내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상태가 된 건 아닐까. 연말과 연초에 몰린 지원사업, 공모전을 해내야 하는데 도무지 마음처럼 작업이 되지 않았다.
다시 <여행과 나날>을 보고 영화관을 나섰을 때, 짧은 여행을 하고 나온 기분이었다. 정말 안 될 때는, 억지로 붙잡고 있기 보단 순간에 집중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싶어졌다.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것. 나는 그 사실을 조급함에 자주 잊어버리곤 한다. 우리를 가두고 방해하는 쓸데없는 '말'로부터 마음놓고 해방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보자. 아직 <여행과 나날>을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좋은 작품이란, 얼마나 인간의 슬픔을 담고 있느냐에 달려 있지."
인간의 슬픔을 가만가만 들여다볼 줄 아는, 슬픈 인간을 예쁘고 따스하게 그려내는 미야케 쇼 감독의 깊이 있는 시선을 좋아한다. 인물의 슬픔을 짐작하게 하면서도 함부로 건드리지는 않는. 요즘 동시대 감독 중 이토록 사려깊은 태도로 영화를 만드는 이는 정말 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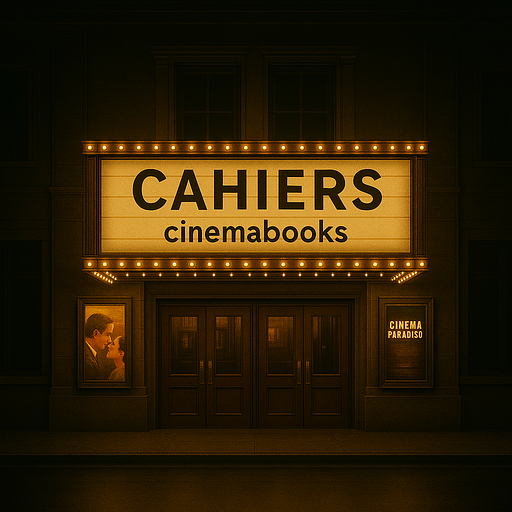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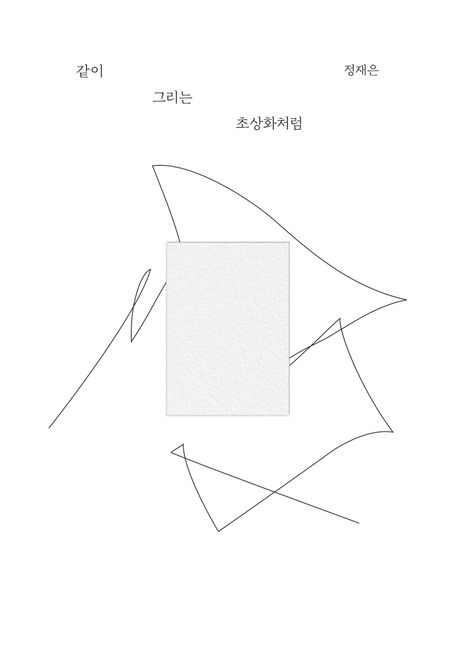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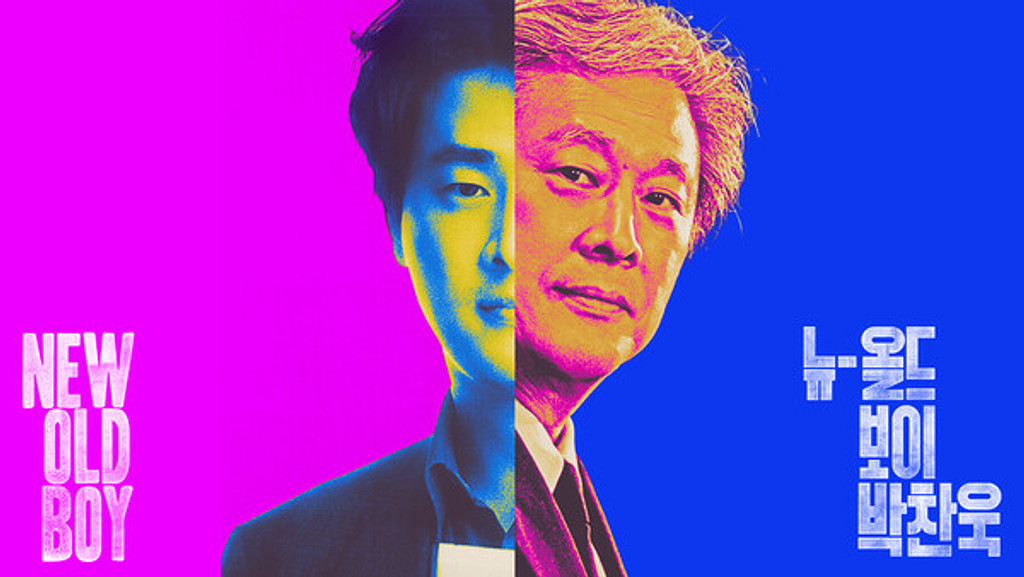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