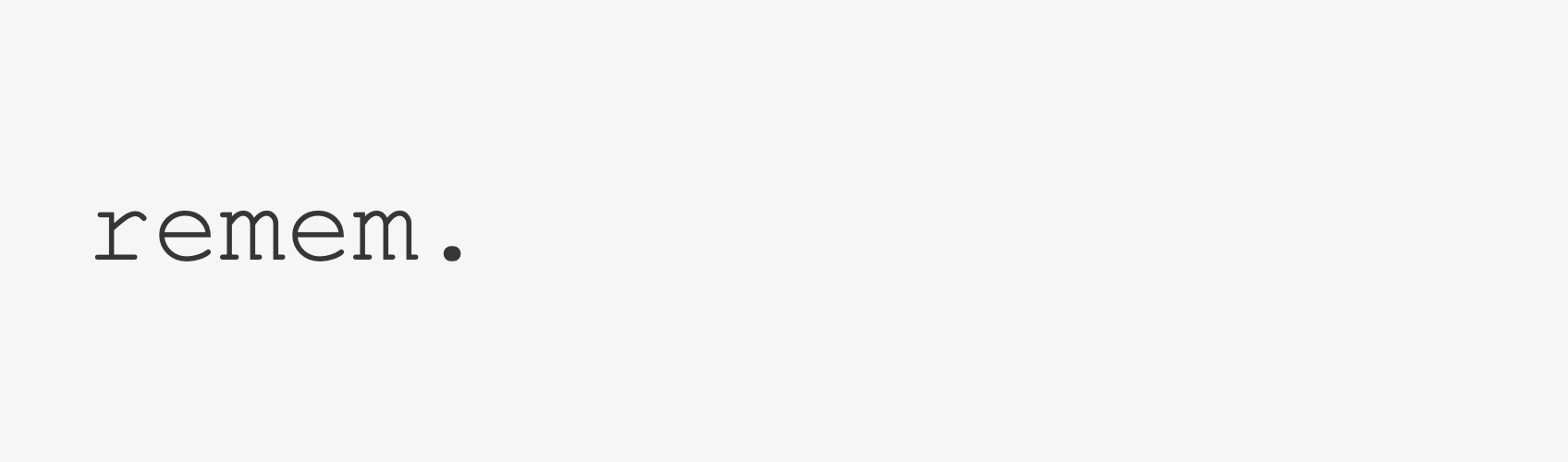
# 책 <세월> 아니 에르노
그렇다. 우리는 잊힐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 보이고 심각해 보이며, 버거운 결과로 보이는 것들, 바로 그것들이 잊히는, 더는 중요해지지 않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상한 일이다. 지금 우리는 언젠가 엄청나고 중요하게 여겨질 일이나 혹은 보잘 것없고 우습게 여겨질 일을 알지 못한다. (중략)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몫이라고 받아들이는 오늘의 이 삶도 언젠가는 낯설고, 불편하고, 무지하며, 충분히 순수하지 못한 어떤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누가 알겠는가, 온당치 못한 것으로까지 여겨질지도.
안톤 체호프
- 모든 장면들은 사라질 것이다.
- 우리의 기억은 자신의 외부에, 시간의 비바람 속에 있다.
- 나는 조용하고 편안한 이 삶에 정착하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이 삶을 살아 버리는 것이 두렵다.
-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거칠게, 사과 없이 말꼬리를 자르며 말했다.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 쾌락이 드러났다. 태도의 자유로움과 몸의 에너지가 화면을 뚫고 나왔다. 그것을 혁명이라고 한다면, 그렇다, 혁명은 그곳에 있었다. 선명하게, 육체의 팽창과 안이 속에, 혁명은 아무 곳에나 앉아 있었다.
- 그러나 어쨌든 학교는 무언가에는 쓸모가 있었다. 우리는 끝도 없이 묻고 또 물었다. 생각하고, 말하고, 글을 쓰고, 일하고,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기 : 우리는 모든 것을 시도해도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968년은 세상의 첫해였다.
-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대에 이 땅 위에 살다간 그녀의 행적을 이루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녀를 관통한 그 시간, 그녀가 살아 있을 때만 기록할 수 있는 그 세상이다.
# 다윈의 후계자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미국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26일(현지시간) 타계했다.
윌슨 교수는 1950년대 생물학계에서는 주변부로 여겨지던 개미 등 곤충들의 행동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진화생물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석학으로 꼽힌다. 특히 찰스 다윈으로부터 시작된 진화론의 바탕 위에서 인간의 사회적 활동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통해 사회생물학을 창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현대의 다윈’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때문이다.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벽을 넘어서 학문 간 통합과 소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저서 <통섭>은 고인의 제자인 최재천 전 국립생태원장의 번역으로 국내에서 널리 읽히기도 했다. <통섭>은 <사회생물학> 이후 32년만에 나온 그의 최대 역작으로 꼽힌다. 최 전 원장은 통화에서 “윌슨 선생님은 ‘현대의 다윈’으로 불리는 학계의 아이돌과 같은 분이었지만 항상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따뜻했고 학문적 정열이 충만한 분이었다”고 회고했다.
#
바늘에 찔리면 바늘에 찔린 만큼만 아파하면 된다. "왜 내가 바늘에 찔려야 했나" "바늘과 나는 왜 만났을까" "바늘은 왜 하필 거기 있었을까" "난 아픈데 바늘은 그대로네" 이런걸 계속해서 생각하다보면 예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망가지기 쉽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