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낭소리’라는 영화를 보지 않은 건지 못한 건지, 아무튼 나는 보지 못했다. 30개월도 아닌 30년 키운 소가 등장한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하는데 말이다. 영화 '식객'에서도 잘 키운 소를 도축장에 보내는 장면이 있다고 한다. 그 소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주 명품 연기였다고 하는데 이 영화 역시 보지 못했다. 살아있는 소가 너무 이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소의 팸플릿을 보니 구역질이 나서 말이다.
나의 업무는 주로 죽은 소를 보는 것이다. 도축라인에 아킬레스건을 고리에 걸어 거꾸로 매달아 놓은, 벌건 소를 보면 그냥 고깃덩어리일 뿐이다. 살아있는 소는 1t이 넘기도 한다는데, 내가 보는 소는 머리와 내장이 제거되어 남은 300kg~ 700kg가량의 소가 전부다. 소의 얼굴도 뙤록한 눈망울도 볼 일이 없다. 나는 그저 뼈와 고기, 마블링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면 된다. 고기의 품질을 세분화시켜, 키운 사람은 얼마에 팔지 소비자들은 얼마에 사 먹을지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그럼 그 소들은 어디서 어떻게 도축장까지, 내 앞으로 오는 걸까?
소 농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아 큰 소가 될 때까지 같은 농장에서 계속 키우는 '일괄 사육' 농장과, 태어난 지 두어 달 된 송아지를 가축시장에서 대략 3백만 원 정도에 데려와 키우고(육성) 살을 찌워(비육) 출하하는 농장이 있다. 후자는 소의 생애주기(번식우, 육성우, 비육유 등) 중 일정시기만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방법인데, 새끼만 낳던지 살만 찌우 던 지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소를 키우는 방식인 셈이다. 어느 농장이 됐든 송아지는 조금만 크면 같은 개월령끼리 모아서, 어미소와 떨어져서 살아가게 된다. 그때부터 그 친구들은 그들의 운명을 알까 싶다. 앙상한 다리로 날쌔게 축사를 뛰어다니는데, 그게 기분이 좋아선지 슬퍼선지 알 길이 없으니 말이다.
수컷 소(이하 ‘수소’)는 성장이 빠르고 근육이 잘 붙어 고기량이 많지만, 지방이 잘 생성되지 않아 마블링이 거의 없다. 누가 이런 고기를 먹어? 할 정도로 지방 하나 없는 시뻘건 고기 말이다. 심지어 수소 특유의 누린내가 나기도 한다. 강아지가 중성화수술을 하는 이유와 같이 성성숙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의 송아지는 쥐도 새도 모르게 고환이 잘린다. 거세우라고 하는데, 이 소들은 암소처럼 마블링이 가득한 고기를, 수소처럼 많은 고기양을 빠른 시기에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당연 천연(?) 수소와 암소보다 못하지만, 암컷과 수컷의 장점들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30개월 정도 키우면 우리가 보자마자 '우와-'하고 입이 떡 벌어지는 1++(투쁠러스) 등급의 고기가 나올 수 있다. 키우기 나름이긴 하지만.
암소는 보통 두 번 정도 새끼를 낳고 비육시켜 출하한다. ‘비육’이라는 것은 마블링이 가득한 고기로 만들기 위해 열량 높은 사료를 급여하며 살을 찌우는 것을 말하고, ‘출하’한다는 건 고기로 사용하기 위해 도축장으로 보내 도축한다는 뜻이다. 소는 285일간의 임신기간을 가지며, 소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면 ‘프리마틴’이라는 중간 성별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소는 보통 한 번에 한 마리만 임신할 수 있다. 두 번 출산하면 소는 생후 50개월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연골이 닳아 없어져 소 품질이 떨어진다고 간주한다. 그러니까, 한 마리의 암컷은 두 번, 총 두 마리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면 자신의 본분을 다한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암소에게 주어진 마지막 일은 도축되어 그녀의 살코기를 나누어주는 것뿐이다.
‘소고기는 암소가 최고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고작 30개월이라는 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세나 수소보다 적어도 20개월은 더 산 소가 더 맛있다는 말이다. 다른 소보다 더 살았기 때문에, 근육은 조금 더 질겨 씹는 맛이 생기고, 고기 맛도 진해진단다. 반대로 짧게 사는 소는 그만큼 부드럽고 쉽게 넘어가는 맛이니, 취향껏 즐기면 된다.
나는 일을 하면서 하루에 몇십 마리에서 몇백 마리까지 보곤 한다. 소는 목과 발목이 잘리고 벌건 속살과 하얀 지방살이 보이도록 가죽을 멀끔하게 벗겨져있다. 이등분된 소는 아파트 2층은 족히 되는 높이의 냉동실에 줄줄이 걸어놓는다. 도축되어 축 늘어진 소가 바닥에 닿지 않게 높은 곳에 걸어두는 것이다. 소를 판정하는 등심은 척추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데 이걸 보려면 계단 3개 정도는 올라가야 한다. 판정을 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층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다. 내 허벅지가 튼실해지는 건 덤이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일하냐는 사람들이 많다. 처음엔 울면서 일하는 직원들도 꽤나 있을 정도로 호락호락한 곳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뭐든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도축장도 마찬가지다. 거꾸로 매달려 있는 소를 보면 정육점에 널린 고기처럼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죽은 소의 시체라 징그럽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그냥 내가 해내야 하는 업무로 인식될 뿐이다. 나는 그저 피가 뚝뚝 떨어지다 못해 피 고드름이 된 소를 보며, 마블링 번호를 매기고 육색과 지방색을 확인하고, 뼈를 발라내면 어느 정도 양의 고기가 나올지 등 품질을 확인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인지 도축장에 끌려오는 소와 도축되기 전에 계류장에 들어가 줄 서있는 소를 보면 어쩐지 구역질이 난다. 소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위화감이 든다. 속이 미식미식한 게 그 친구들을 보는 것이 몸부터 거부한다. 환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검은 점을 보고 있는 느낌이랄까. 내 업무가 될 상대가 생명체라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것이라고 인식하는 게 어렵고 두렵다.
계류장은 멀리서 트럭을 타고 온 소와 돼지들이 쉬면서, 전날 먹었던 사료를 소화시키고(도축 중에 내장이 터지면 사료가 고기를 오염시켜 쓸 수 없게 된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얇은 가닥의 물을 맞아 애벌 샤워를 하는 곳이다. 쉽게 말하면 도축 전에 몸을 깨끗이 하고 차례를 기다리는 곳이다. 크고 좋은 도축장은 소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기도 한다. 음악감상하는 소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하지만, 아기 주먹만 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다. 음머음머- 우는 소들은 말 그대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울고 있었다. 곧 죽을 거라는 걸 아는 것 마냥, 태어나자마자 어미소와 떨어져 고기로 생산될 운명이라는 걸 언제부터 알았던 것 마냥. 그 눈물에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리는 소가 가끔 꿈에 나온다. 목이 잘린 소도 꿈에 나온다. 매일같이 보면서도 미안한 마음에 정말 채식주의자가 된 동료들도 있다. 사람들의 식량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필수 단백질 섭취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누군가는 꼭 해내야 하는 일이라, 나는 일과 현실을 단절시켰다. 그러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다. 동물들의 무고한 희생을 모른 척, 그렇게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글쓴이 오이
수능 성적에 맞춰 축산학과를 갔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다 보니 도축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익숙해지지 않는 죽음과 직업 사이의 경계를 방황하면서, 알고보면 유용한 축산업 이야기를 쓴다.
페이스북_ https://www.facebook.com/52wri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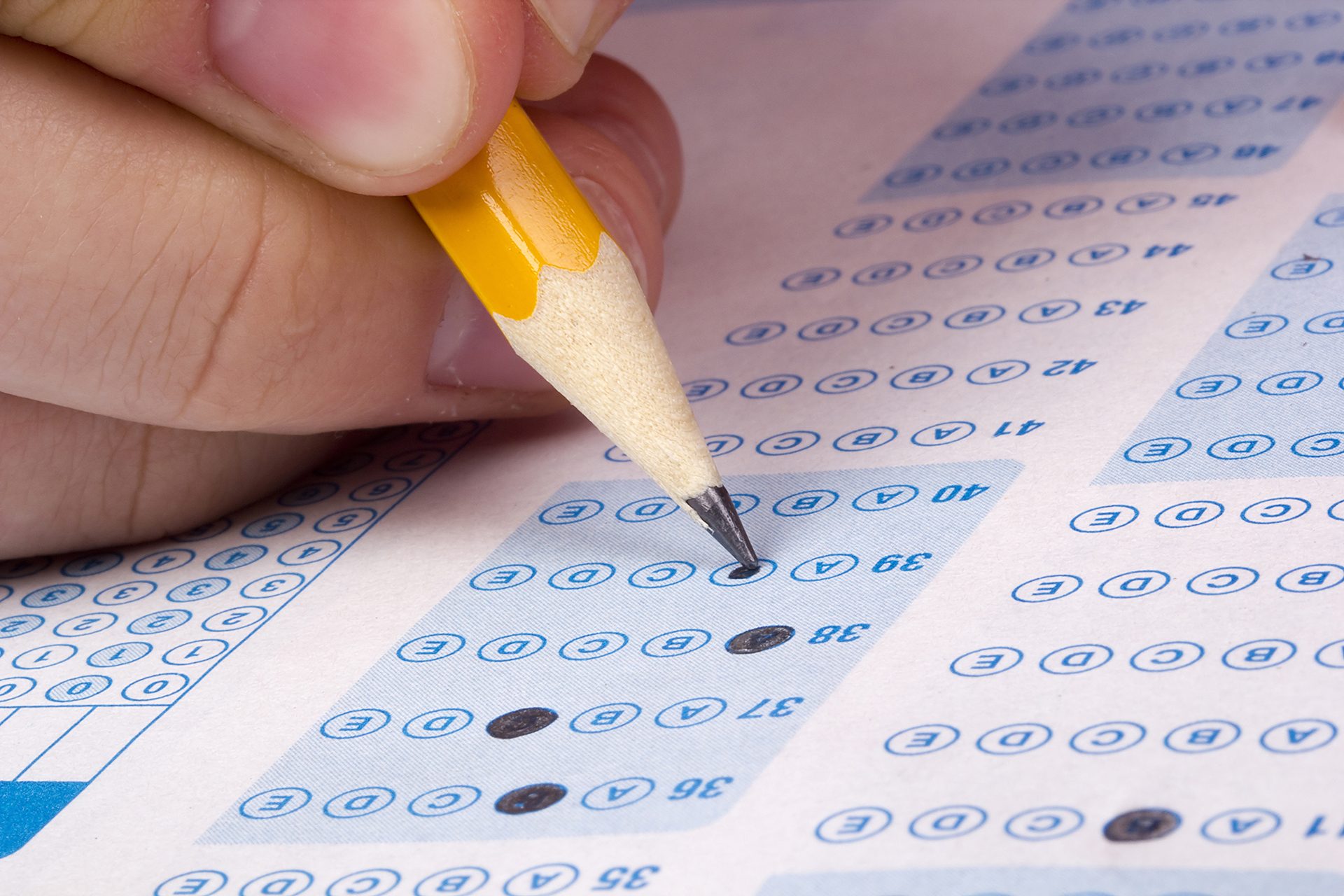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