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타국으로 이사를 간 후 첫 평일이었다. 장거리 여행으로 집을 오래 비울 때면 집열쇠나 차키를 서로에게 맡기고 주중에도 여러 번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어서 우리는 지난주 내내 작별인사를 했던 터였다. 어제 갔던 교회에서도 유난히 소속되지 않는 것 같았던 느낌이 떠올랐다.
이 끈덕진 감정은 뭘까. 외로움이었다. 외롭다고 이름 짓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나는 외로움을 잘 타지 않는 사람이야’라는 말이 소위 쿨해 보이기 때문일까. 외롭다고 인정하는 순간 외로움이 파도처럼 나를 덮칠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들춰보고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무리 봐도 영락없는 외로움이었다.
나의 외로움의 역사는 깊다. 선명한 기억은 대학 입학 후 기숙사에서 지낼 때였다. 대부분 각자의 본가로 돌아간 겨울방학 어느 날, 나는 어떤 연유에선지 기숙사에 남아 눈이 쌓이는 창밖의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눈을 보기 힘들었던 고향에서는 눈이 오는 날은 축제였다. 눈이 흩날리기라도 하면 온 동네 아이들이 약속한 듯 달려 나왔고, 손에 닿자마자 녹아버려 한 줌 쥐기도 힘든 눈을 훑으며 깔깔거리곤 했다. 하지만 차창 너머의 눈은 더 이상 짜릿함이 아니었다. 콕콕 쌓이는 그리움이었다.
그 시절 나는 외로움 앞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속수무책으로 눌리거나 도망치곤 했다. 홀로 저녁에 불 꺼진 방 컴퓨터 앞에 앉아서 ‘파도타기’(친구의 홈피를 거쳐 다른 이의 홈피로 이동하는 것)로 친구들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뒤적이거나 밤늦게 흘러나오는 라디오에 마음을 기대곤 했다. 그러고 전원을 끄면, 다시 외로움이 매섭게 찾아와 자리를 잡았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도망가려 할수록 더욱더 거세어졌다.

사회신경과학자인 존 카치오포(John T. Cacioppo) 교수는 ‘외로움은 고통이나 목마름 같은 일종의 경보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 때문에 힘들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은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동일한 부위라고 한다.** 손가락이 찢기거나 부러지면 생기는 고통은 치료를 해 달라는, 몸의 사인이다. 이와 비슷하게 지금 좀 더 깊은 유대감이 필요한 상태라고 마음이 진단해서 보내는 ‘고통의 신호’가 외로움인 것이다.
외롭다는 것은 의존적이라거나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다. 정신적인 장애는 더더욱 아니다.* 외로움은 다만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갈망의 반증이다. 모든 마음의 고통을 대하는 일이 그러하듯, 그저 그 저릿한 갈망에 시선을 두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느슨한’ 관계를 선호한다. 각자의 삶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깔끔해서 좋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느슨한 관계만으로도 유대감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다른 임계치를 타고 태어나는 것이다.
나는 그 임계치가 좀 더 높은 편에 속했다. 긴밀한 유대감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내 주변에는 늘 '서로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훤히 아는'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다. 대학 기숙사 생활을 마치고 수년 동안 함께 자취한 룸메이트가 있었고, 결혼 후에도 아이를 통해 맺어진 친구들과는 서로의 부엌과 거실을 수시로 들락거렸다. 하지만 그저 모임을 많이 가고 친구들을 자주 만난다고 내가 바라는 유대감이 채워지지는 않았다.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그 마음을 나눈다고 느낄 때에야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찾아왔다.
각자의 임계치가 다르므로 마음이 잘 맞는다는 느낌 또한 사람마다 그 모양이 다르다. 나는 내 머릿속에 가득 찬 고민을 스스럼없이 나눌 수 있을 때, 독서모임이든 생태모임이든 더 나은 삶이라고 여겨지는 무언가를 함께 시도할 때 ‘충분히’ 연결됐다고 느꼈다.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같이 배우거나 소소하고 즐거운 활동을 같이 할 때, 또는 누군가와 매일의 일상을 공유할 때에 연결된다고 느낀다.
내가 어느 정도의 유대감이 필요한지, 어떨 때 유대감을 느끼는지는 관계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일단은 피상적이거나 일시적이더라도 관계를 위한 무언가를 시도해볼 때 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 외로움의 임계치가 높든 낮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정도와 방식으로 크고 작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외로움이라는 신호에 반응하는 방법일 것이다.

지금 나는 편안한 서재방을 두고 불 꺼진 침실에 굳이 노트북을 들고 와 불편한 자세로 글을 쓰고 있다. 남편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글을 쓰다 막히면 괜히 말을 걸기도 하고, 남편의 온기 덕분에 적당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인간이란 누군가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취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외로움의 신호등이 켜져 있을 사람들을 하나둘 떠올린다. 든든한 밧줄 같은 연결감이 필요한, 크고 작은 어렵고 고독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견딜만한 힘을 얻지만,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행동이 모여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옅어지게 만들 것이다. 유대감이 필요하다는 타인의 신호에 부응하는, 다정한 걸음을 떼는 순간이다.
참고자료
*존 카치오포, 윌리엄 패트릭. (2013).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이원기 역. 민음사.
**Naomi I Eisenberger, Matthew Lieberman, & Kipling D Williams. (2003). Does Rejection Hurt? An fMRI Study of Social Exclusion. Science. 302(5643). 290-292.
* 글쓴이_이지안
여전히 마음 공부가 가장 어려운 심리학자입니다. 캄캄한 마음 속을 헤맬 때 심리학이 이정표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같은 고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닿길 바라며, 심리학을 통과하며 성장한 이야기, 심리학자의 눈으로 본 일상 이야기를 전합니다.
상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lo_kirin
인스타그램 @kirin_here
페이스북 이지안 Fac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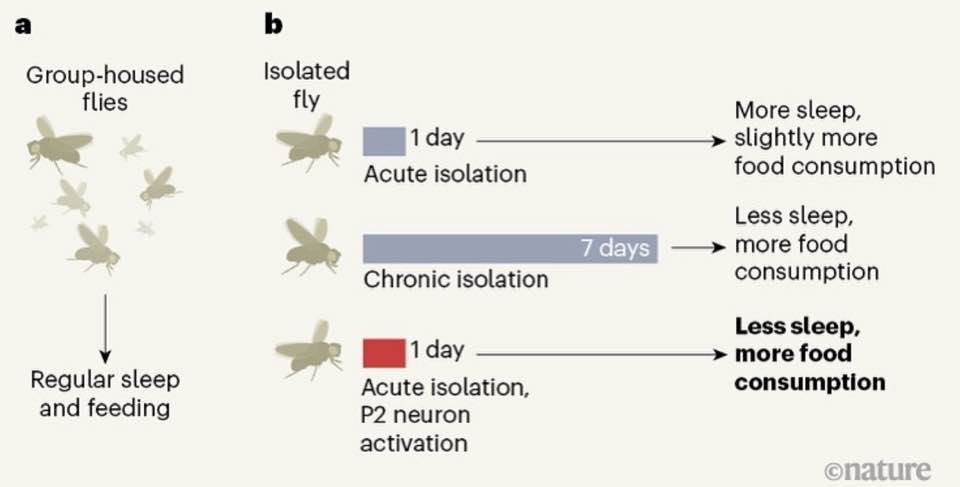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