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날이 있다. 마음이 울적 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가라앉는 날. 사실 마음에 이유가 없는 경우는 없어서 더듬더듬 톺아가다 보면 소소하게 스트레스 받은 일들이 떠오른다. 어제는 친한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갔고, 그 전에는 귀에 생긴 염증이 잘 낫지 않아 걱정스러웠고, 밀려있는 일이 부담스럽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로도 설명되지 않는 깊은 가라앉음이 있다. 월경전 증후군(PMS)인가 싶어 주기를 점검해보아도 맞지 않고, 최근 몸에 무리가 될 정도로 수면량이 적거나 스케줄이 빠듯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걸까.
고요한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당근케잌을 먹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나름 기분을 달래보지만, 그럼에도 끝도 없이 무거워진다. 아무리 마음을 분석하고, 또 이렇게까지 무력할 일이 아니라고 나를 타이르고, 새로운 기대를 억지로 심어보아도 여전하다. 나는 슬픈 것이었다. 어떤 연유에선지, 툭 하면 눈물이 나올 만큼 슬픔이 눈 아래까지 찰랑거리고 있었다. 여러 크고 작은 상실감과 불안을 실은 채 덜컹덜컹 굴러오던 수레가 턱, 하고 조금 큰 돌부리에 걸려 휘청이고 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핸드폰을 꺼내들고 친구들에게 SOS를 청한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 때나 어느 주제의 이야기도 맥락 없이 불쑥 던질 수 있는 친구들이다. ‘지금 하늘 봐, 너무 멋지다’거나 ‘편의점 왔는데 실내화를 짝짝이로 신고 나왔어’ 같은 시덥지 않은 이야기부터 ‘상사한테 한 소리 들었어’, ‘아이가 저녁 내내 짜증을 냈어’ 같은, 순간 타오르는 감정까지 채팅창에 툭툭 뱉어놓는다. 그러면 와르르 달려들어 맞장구를 치고 분노를 뿜어내준다. 이미 채팅방에는 싱거운 농담부터 주소 잃은 감정들이 가득하므로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너무 무겁진 않을까’ 하고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 어떠한 마음의 요동도, 기쁨이든 슬픔이든 두 팔 벌려 맞이해줄 것만 같다.
회사 동료이자 같은 임상심리학 전공자인 친구에게도 자주 터놓는다. ‘이런 바람이 있었던 거 아닐까’ 라고 심리학자의 시선에서 조심스레 분석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저런 질문을 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의 이면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마음을 공유하고 분석해 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로 어느 때에 화가 나거나 슬퍼지는지’, ‘이 일이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어떨 때 뿌듯해지는지’ 같은 서로에 대한 정보가 가득 쌓여간다. 우리는 서로에게, 차트를 굳이 꺼내보거나 문진표를 작성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오랜 마음 주치의인 셈이다.
‘나 이러저러해서 우울한가봐’, ‘상태가 좋지 않아’라고 말을 건네면 이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힘들지’라는 토닥임으로, ‘왜 그런 거 같아?’라는 질문으로 마음에 이불을 덮어준다. 물론 내 마음에 닿는 말도, 그렇지 않은 말도 있지만 조심스레 살펴봐주는 시선이 한 번 지나간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다. 시선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남들에게 내 얘기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몇 시간이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기도 하고 내 마음을 꺼내는데 답답하리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들을 때만큼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같이 헤매고 또 길을 찾고 마침내 '이 마음이구나‘하고 얼추 포개어지는 곳을 발견할 때까지 마음을 다해 듣는다. 그래서인지 그 진심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곁에 남았다.
‘우리의 피부 바깥에 있는 존재는 누구도 우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공감이라는 것은 애써 그 경계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다. 내 마음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힘껏 헤아려보며, 저 상황에 나라면 어땠을까를 상상해보며, 혹여나 너무 멀리가거나 피상적이어서 상대를 더 다치게 하진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며 고운 말을 정제해서 건넨다. 그 정성이 전해져 무거운 추를 달고 끝없이 내려가던 마음도 조금 가벼워진다.
그리고 주섬주섬 해야 할 일을 찾는다. 문서 파일을 열고, 마음 한 구석 무거운 돌덩이를 느끼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칸을 채운다. 동료와 소통을 하고 문서를 다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가 있다. 잠시나마 마음 속 무거운 돌덩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듣고 간식을 차려주다 보니 돌덩이가 있었다는 것을 잠시 잊었다.
물론 그 모든 일을 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기분이 가라앉는 경우도 있다. 일상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버거울 만큼 힘들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울한 감정은 우리가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이에 무시로 왔다가 가곤 한다.
이미 찾아온 기분은 어찌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곁에서 한 두 마디 마음을 덜어줄 친구가 있다면, 그 무게를 견디는 시간이 훨씬 수월해진다.
힘들 때 곁에서 지지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나 혈압이 낮아진다고 한다*. 사람들의 지지가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주고 회복에 기여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다. 트라우마 치료의 권위자인 베셀 반 데어 콜크(Bessel van der Kolk) 교수는 이 때 중요한 것은 ‘상호 의존’으로, 상대방이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있고 상대의 마음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때 사회적 지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이야기했다**.
내 마음을 덮어주는 언어는 나를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언어로부터, 높다란 기준을 들이대며 나를 약자로 만드는 사회의 언어로부터 단단한 보호막이 되어준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을 견디고 마주하고 겪어낼 수 있는 용기를 준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위험에 처할 때 비상연락을 돌리듯, 마음이 위험 상태일 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이 필요하다. 비상연락을 돌릴 수 있는 이들이 떠오른다면, 그리고 그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안전감을 얻고 있는 셈이다.
여러 날이 지난 지금 마음은 평소의 평온을 되찾았다. 왜 그런 무거운 감정이 다녀갔는지 여전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언젠가 또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럴 때 감정 속으로 뛰어들지 않고 곁에서 버틸 힘을 실어줄 누군가를 찾아본다면, 그리고 그 온기를 끌어안는다면, 그 선택이 내 마음을 보살펴 줄 거라 믿는다.
공명의 경험은 전염이 된다. 누군가가 내 마음 속 일렁이는 우물을 가만가만 들여다봐주고 길어 올려줬을 때 안도했던 경험은 몸 어딘가에 각인된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경험했던 눈길로 바라봐주고 또 공명하려는 태도로 고쳐앉게 만든다. 그 선순환의 고리에 머물수록 공명의 파장은 더 깊고 더 넓어질 것이다.
참고자료
*Mark. P. Roy, Andrew Steptoe and Clemens Kirschbaum (1998).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moderator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ardiovascular and cortisol reac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5), 1273-81; Uchino, B. N., & Garvey, T. S. (1997). The availability of social support reduces cardiovascular reactivity to acute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0, 15–27.
**베셀 반 데어 콜크 (2020) 몸은 기억한다 (제효영 역). 을유문화사.
* 글쓴이_이지안
여전히 마음 공부가 가장 어려운 심리학자입니다. 캄캄한 마음 속을 헤맬 때 심리학이 이정표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같은 고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닿길 바라며, 심리학을 통과하며 성장한 이야기, 심리학자의 눈으로 본 일상 이야기를 전합니다.
상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lo_kirin
인스타그램 @kirin_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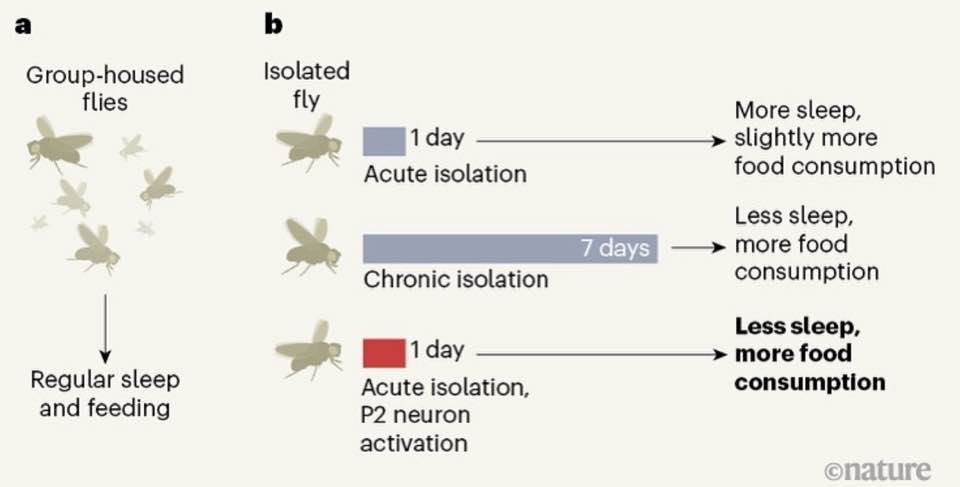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보배
작가님 이번 글은 꼭 제 마음을 들여다 보고 적어 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해결책까지 제시해주시다뇨.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이지안
보배님께 와닿았다니 기쁩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순간인 거 같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