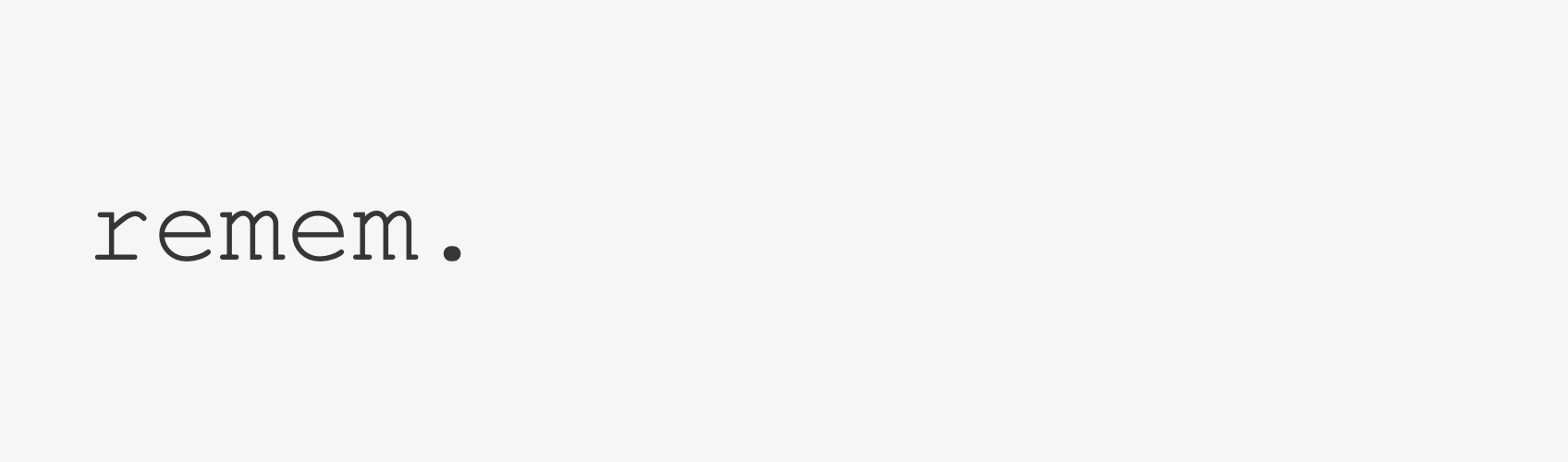
#
처음엔 수학이 재미있었지만, 입시와 연관돼 있어 수학의 기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중3 때 경시 대회 나가볼까, 과학고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하시더군요. ‘나는 수학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해 버리게 됐어요. 수학자가 된 지금 돌이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뭘 하기에 늦었다’는 말을 너무 많이, 가혹하게 해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어떤 일이라도 시작하기에 늦은 일은 없지 않을까요?'
수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 능력 편차가 크진 않다고 봐요. 능력 차이라기보다는 ‘취향의 밀도’ 차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걸 사랑한다는 강렬한 끌림을 느끼는 사람이 그 분야를 특화해 계발하는 과정에서 천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소설책처럼 한 번 읽어 바로 이해되면 좋으련만 수학자도 누군가 정리한 이론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의 논리 사슬을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이미 만든 틀로 이해하려 들기 때문이죠. 그걸 편견이라 표현했어요. 사람의 두뇌는 천천히 생각하기를 잘 못 합니다. 어떤 정보를 주면 1초 만에 이런 걸 거야 하고 큰 그림을 그려 버려요. 상대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자기 나름의 파악을 끝내버리죠. 정교한 소통이 필요한 경우엔 큰 약점이 됩니다.
분필로 칠판에 쓰는 행위는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을 응고시키는 행위예요. 연주자가 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무언가 물리적으로 구현해 낸다는 즐거움도 느끼고요. 답이 보이지 않다가도 한 줄 쓰기 시작하면 안 보였던 해법이 보이기도 해요. 또 하나. 판서는 반드시 지워질 숙명을 지녔어요.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현재를 더 충만하게 보내듯, 칠판에 쓰여 있는 필기가 곧 사라질 걸 알기에 그 순간 더 집중하게 됩니다.
수학을 하다보면 수학이 인간적인 사유 행위냐 아니면 절대적인 사유의 대상이 있고 그걸 인류가 '대상 바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냐를 고민하는 순간이 있다. 다른 종의 입장에서 인간과 논거가 다를 수 있음을 수학은 리마인드해준다. 인류는 자신 외에 스스로의 지성에 비견될 종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는 가설이다.
가능한 모든 명제가 놓인 지도를 생각하면 모든 증명이란 지도에서 길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길을 찾는 과정에서 수학자는 인간의 사유에 대해 많은 걸 배우게 된다. 수학자는 수학을 할수록 인간이 어떤 생각하는지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작업이 수학임을 깨닫게 된다. 모든 학문은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방향이자 노력이다.
문제를 다 풀고 이론을 만들고 난 뒤 다른 이론과 잘 어울리는가를 판단해보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가 있다. 그런 아름다움 속에서는 신이나 절대적인 어떤 존재의 솜씨를 의심하게 된다. 어떤 절대적인 사유의 대상이 있고 그걸 인류가 조금씩 발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인간은 영원히 모르겠지만 말이다.
수학자로서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내가 못 풀었기 때문'이 아닐까(웃음). 멋진 논문을 써서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심리적 고통을 낳는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충분히 성숙해 나가고 있고 '지금의 나는 알지 못하더라도 분명하게 멀리서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시와 수학은 여러 면에서 닮았다. 첫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이디어를 종이 위에 고체화 시킨다. 둘째, 읽거나 읽히기가 쉽지 않다. 셋째, 그래서 읽는 사람이 없다(웃음). 수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 부러운 이유는 직접적이고 또 누구에게나 소통이 된다는 점 때문이다. 행위로서 시를 쓰거나 수학 증명을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느끼고 본 것을 기록해 공유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지 않을까.
난 수학자로서 거대한 엔진이 되길 원치 아니하고 엔진의 작은 톱니바퀴로서 기능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여러 톱니바퀴들이 모여 만든 현대수학이라는 엔진이 잘 작동하고 있으므로, 나는 엔진 어딘가에서 순간순간에 감격할 뿐이다. 수학하는 행위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증명은 '나'로부터 대상에 몰입하는 아름답고 고귀한 순간이다.
대망까진 아니고 소망(小望)이 있다.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것. 그리고 수학을 향한 호기심을 끝까지 유지할 것. 아직 30대여서 이런 말을 하기에 이르다는 걸 알지만, 날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분명한 팩트는 '나는 죽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막이 내리기 전에 어떤 발견을 하고, 다른 사람의 발견의 순간을 궁금해하는 것. 이로써 나와 타인이 궁금증과 그 결과물을 편지이자 유산처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충족감을 없을 것만 같다. 수학자의 진짜 유희란 그런 것이 아닐까.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