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ara 입니다.
이번주는 수요일이 휴일이라 일주일이 가뿐한 느낌이 드는 한 주 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제 투표 후 즐거운 휴일을 보내셨는지요? 한창 꽃이 피는 시기라 꽃놀이를 다녀오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간만에 집에 있는 여러 위스키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의 위스키를 한잔씩 홀짝홀짝 마시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어제처럼 여러 위스키를 꺼내놓고 니트로, 하이볼로 요리조리 마셔보며 맛을 비교하는 것도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 위스키를 이리저리 맛보다가 이번주 위스키 레터의 주제가 문득 머리 속에 떠올랐습니다. 보관해놓고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위스키, 즉 익어갈 수록 맛이 좋아지는 위스키에 대해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익어가는 술, 오픈 후가 더 맛있는 위스키" 입니다.
위스키를 처음 입문할 때는 항상 바에 방문해서 위스키를 먹곤 했는데요, 처음에는 위스키 바틀 가격에 대한 감이 전혀 없어서 10만원 이내로 살 수 있는 바틀을 바에서 굳이 30만원씩 주고 사서 킵해두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아주 많은 돈을 바에 쏟고 나니.. 그때서야 위스키를 자주 마시려면 제가 직접 바틀을 사는 것이 경제적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틀을 사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바틀을 사면 정말 소장하고 싶은 극소수의 바틀 외에는 사면 다 마셔버리는 스타일이라(ㅎㅎ) 바틀을 사서 뚜따(!) 후, 익어가는 느낌에 따라 한잔씩 마시곤 했답니다.
이런 위스키 라이프를 즐기는 가운데, 오픈 후에 점점 더 맛있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위스키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맛있어지는 느낌이 다른 위스키들보다 두드러져서 기억에 담아두는 위스키들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익을수록 맛있는 위스키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소개드릴 익을수록 맛있는 위스키는 바로 "몰트락 16년(Mortlach 16yrs)" 입니다.

몰트락은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이 것을 몰트락으로 읽을지 모트락으로 읽을지 고민할 정도로 그리 유명한 위스키는 아니었습니다. 몰트락은 디아지오에 속해있는 증류소인데 조니워커 블랙의 주요 원액을 만들어내는 증류소이기도 합니다.
몰트락은 과거 어느 날 바에서 처음 만난 위스키인데, 그 때의 맛이 매우 좋았고 강렬해서 개인적으로 구매까지 하게된 위스키였습니다. 몰트락을 구매하고 처음 딱 뚜(껑) 따(기)를 했는데, 첫 향과 맛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먹었던 기억보다 알콜 향이 너무 강했고, 첫 입이 독하다 못해 약간 쓰다고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꽤나 비싸게 준 바틀이었는데... 라고 약간의 후회와 함께 뚜따 후 몰트락을 위스키 장 구석탱이에 박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흘렀고 바쁘게 살다보니 위스키를 통 못마시다가 정말 오랜만에 위스키를 마셔야겠다 생각을 하고 몰트락을 한잔 마셨는데, 그 때의 맛은 첫 뚜따했을 때의 맛과 완전 다른 향긋한 맛이..!! 쓰다고 느꼈던 맛은 오히려 진하고 묵직한 느낌이었고 여기에 쉐리향이 겸비된 향이 나면서 오히려 깊은 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향이 느껴졌습니다. 피니시도 아주 좋아서 아니, 똑같은 위스키의 감상이 이렇게 다르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에어링이 되서였는지 아니면 위스키를 마시던 제 상황과 기분이 달라서였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뚜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것이 훨씬 더 맛있었던 기억에 남는 위스키 입니다.
두번째로 추천 드릴 익을 수록 맛있는 위스키는 바로 "베이즐 헤이든(Basil Hayden's)" 입니다.

베이즐 헤이든은 버번 위스키 입니다. 버번 위스키는 보통 싱글몰트보다 도수가 높은 것이 특징인데, 이 베이즐 헤이든은 버번 위스키 치고는 상당히 낮은 40도 정도의 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먹기 좋은 버번 위스키이기도 하지요.
이 베이즐 헤이든은 열자마자 마셔도 상당히 맛있지만 시간을 두고 마시면 훨씬 부드러움이 극대화 됩니다. 보통의 버번 위스키에서는 느끼기 힘든 부드러움과 함께 플로럴한 향 그리고 버번의 장점인 달달한 맛까지 가미되어서 시간이 갈수록 그 매력이 한층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즐 헤이든을 소장하기 아주 좋은 위스키로 추천드리곤 합니다. 처음 뚜껑을 따서 마시는 순간부터 한 병을 다 비우기까지 말그대로 점점 익어가는 술의 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의 맛과 향이라는 것은 참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그 술을 마실 때의 나의 상태와 기분, 그 때의 상황과 경험들이 매번 달라지니 어쩌면 술의 맛도 늘 다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위스키의 맛과 향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어쩌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 느꼈던 두 위스키의 향과 몇년 뒤에 느끼는 위스키의 향과 맛은 또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 이유에서 저는 저의 위스키 레터에서 소개하는 위스키에 대한 감상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꼭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와 정 반대로 느끼는 분들도 계실테고, 이런 다양한 감상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리는 위스키에 대해서 다른 느낌, 다른 감상, 다른 생각을 공유해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맛있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맛있어!"와 같은 편협한 생각은 위스키나 술을 즐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크게 해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일이나 말도 그 날의 나의 상태와 상황으로 인해 때로는 쓰고, 때로는 달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매 순간과 그 순간의 감정, 감각들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잡생각을 한 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위스키 레터는 여기까지 입니다.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세상이 에너지를 찾고 있는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구독자님들의 하루하루에도 본격적인 봄이 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레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주에 더 재미있는 위스키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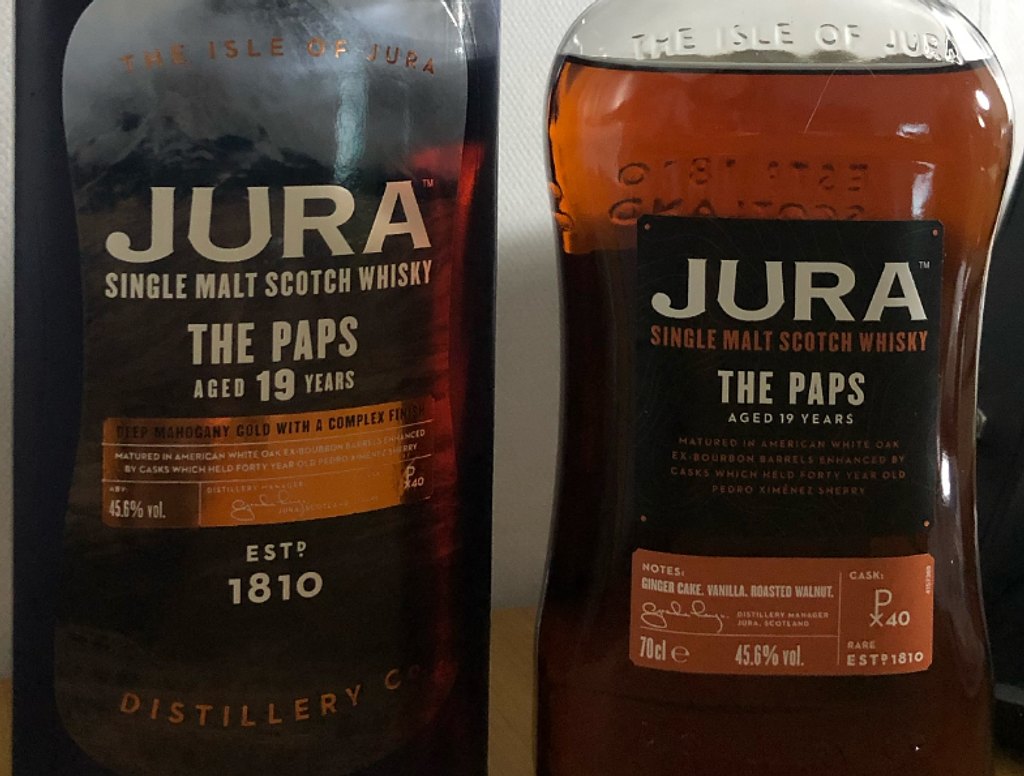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