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의 시네마 분더카머
스티븐 스필버그의 <파벨만스>를 보고 제가 떠올린 건 영화가 아니라 책이었습니다. 몇 해 전, 계간 『문학동네』는 100호를 맞아 100명의 시인과 소설가들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그 답을 모아 100호의 특별부록으로 『아뇨, 문학은 그런 것입니다』를 발행했는데요. 이 특별부록의 취지에 대해 책은 이렇게 소개했네요.
우리는 『문학동네』 100호 기념호의 일환으로 지난 25년간 『문학동네』의 지면을 빛내주신 100인의 시인・소설가들에게 공통의 질문-“문학은 나에게 무엇이었고, 무엇이며, 무엇일 것인가?”-를 던지고 그 답을 모아 별책으로 꾸몄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한 작가의 문학적 작업의 과거-현재-미래를 돌아보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장면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 개별적인 장면들이 모여 최근 한국문학의 흐름과 전망을 예감하게 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빛나는 100편의 답이 모여 있는 이 한 권의 책이 『문학동네』를 사랑해주신 독자들께 작지만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뇨, 문학은 그런 것입니다 - 문학동네 100호 특별부록』, 「펴내며」, 9쪽.
‘문학은 나에게 무엇이었고, 무엇이며, 무엇일 것인가?’. 시인과 소설가들은 자신에게 던져진 질문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할 말이 많아 책 한 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았을까요. 정반대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난감해 했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자신에게 그 물음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과감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문학론을 소개하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라 설명하기 어려워 난처한 듯 머뭇거리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그 문장들 사이로 불쑥 고개를 내민 것처럼 제 눈길을 잡아채는 문장은 이런 류였는데요. 문학에 관한 물음을 자신에 관한 물음으로 바꾸어 설명하는 것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하나같이 시인과 소설가가 문학이라는 것과 처음 직면했을 때의 감격과 감각을 예민하게, 그러나 대담하게 적어놓았는데요. 반짝이는 수많은 문장들 중에서 저는 김애란 소설가의 문장을 골랐습니다.
만일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이 허무나 권태와 맞닥뜨리는 걸 뜻하는 거라면 그걸 관리하는 기술이랄까 도구를 나는 문학을 통해 얻었다. 그리고 갈수록 문학에 대한 어떠한 환상이나 숭배 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의미나 태도에 도취되기보다 다만 기술을 연마하다보니 절로 익히게 된 삶의 자세가 있다.
김애란, 「그랬다고 적었다」, 『아뇨, 문학은 그런 것입니다 - 문학동네 100호 특별부록』, 291쪽.
문학을 통해 익힐 수 있었던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 문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자기 삶이 필요하다는 듯이. 김애란 소설가는 적었습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파벨만스>가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 영화라는 것 잘 아실텐데요. 어쩌면 <파벨만스>도 스필버그 자신의 영화론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영화란 이런 것이어야 해’라며 배우의 입을 빌려 단언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영화는 ‘해석할 맛’이 나지 않을까요. 마치 <레디 플레이어 원>의 가상현실 ‘오아시스’에서 게임의 창시자 제임스 할리데이(마크 라이런스)가 숨겨둔 ‘이스터에그’를 사람들이 찾아야 하는 것처럼요. (그러고보니, 두 영화의 유사한 지점에 대해 또 하나 지적할 수도 있겠네요. 스필버그는 <파벨만스>의 촬영장에 어릴 적 자신이 찍은 영상들, 기록물 등을 배우들이 언제건 볼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다 하는데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제임스 할리데이의 어린 시절을 녹화해놓은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 씬이 생각나지 않으신지요.)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단 한번도 영화를 접해보지 않은 새미(가브리엘 라벨)에게 부모인 버트(폴 다노)와 미치(미셸 윌리엄스)는 영화를 소개합니다. (정확한 대사가 기억나지 않아 뉘앙스만 가져오자면) 버트에게 영화는 ‘활동 사진’(motion picture)이었습니다. 연속촬영으로 기록된 필름을 이어붙이면 그것은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요. 반면, 미치에게 영화는 꿈이자 예술이었습니다. 둘 중 누구의 답이 옳은지 가리기 위해 이 장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파벨만스>는 둘 모두의 답을 끌어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닌 게 아니라, 새미는 꿈이라는 영화의 내용만이 아니라, 영화가 제작되는 원리-필름을 자르고 이어붙이며 마치 실제 총격과 같은 특수효과를 만들어내는-에 대해서도 능했죠. 요컨대 새미는 영화의 내용과 형식을 어린 시절부터 잘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시간이 흐르고, 새미의 학년이 하나씩 올라갈수록 그가 만들어내는 영화의 폭도 넓어집니다. 그에게 영화는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이기도 하고(졸업반의 여행을 담은 ‘땡땡이의 날’), 영화 속 인물의 욕망과 정서를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내밀한 매체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에게 캠핑 영화를 보여줬을 때, 미치는 새미에게 이렇게 말했죠. “넌 날 꿰뚫어보는 구나.”) 새미의 영화는 누군가를 영웅적 인물로 보이게도, 우스꽝스럽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의 수치를 냉혹할 정도로 고스란히 기록해두기도 하지요. 영화에 대해 이토록 폭넓은 그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스필버그의 영화관’이라는 수상쩍은 이름으로 정리하거나 요약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모든 것이 그의 영화관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옳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파벨만스>에서 보여주었던 영화의 모든 기능들이 스필버그가 생각하는 영화라고요. 문득 의외의 지점에서 그의 일관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카메라입니다. 새미와 세상 사이에는 카메라가 있었지요. 어쩌면 그것이 김애란 소설가식대로 말하자면, ‘삶의 자세’인 것은 아닐까요. 김애란 소설가는 문학으로 익힌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이렇게 덧붙입니다.
문학은 내게 추상이나 관념이 아닌 구체와 실감의 영역이며 이 실감은 나를 예감과 공감, 만감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나는 외향적인 인간도 모험심이 강한 작가도 아니다. 다만 어떤 이야기를 보다 잘 전달하고픈 욕구와 기술적 고민을 거듭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하게 됐다. 항상 감각을 열어두고 자극을 받아들이며 편견을 교정하려 애쓰게 됐다. 물론 실패할 때도 많지만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바깥 세계를 내 살갗으로 하나하나 생생하게 느끼고 해석하고픈 욕구를 갖게 됐다.
같은 책, 292쪽.
‘항상 감각을 열어두고 자극을 받아들이며 편견을 교정하려 애쓰는’ 태도.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바깥 세계를 내 살갗으로 하나하나 생생하게 느끼고 해석하고픈 욕구’. 세상과 나 사이에 카메라를 두고, 렌즈를 통해 세계를 감각하고 인지하며, 세상을 자신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내는 일.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세상과 나를 자기만의 언어로 포착해내는 일. 그러니 ‘스필버그의 영화관’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 그 자체일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보거나 접하면, 문득 부러워집니다. 제가 가진 해석적 필터는 그들의 문학과 카메라처럼 감각과 촉수가 예민하게 벼려져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늘과 내일의 차이를 감지해내고, 어제와 오늘 내리쬔 빛의 농도와 기울기를 구별해 낼 수 있게 된다면, 제 삶의 자세는 보다 가지런하게 될까요.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이 남긴 거친 파문처럼,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삶의 기습에 여전히 저는 크게 휘청이는데. 그러니 저는 제 식의 답을 발명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내 삶의 자세는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정립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5회 모기영을 떠올리며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다른 ‘너’인 모기영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는지도 문득 궁금해지고요.
더 풍성해지도록,
모기영은 달려나가겠습니다.
글 : 이정식
편집 디자인 : 강원중
2023년 3월 25일 토요일
모두를위한기독교영화제 주간모기영
주간모기영에 바라는 점이나 아쉬운 점 있으면
아래 버튼을 눌러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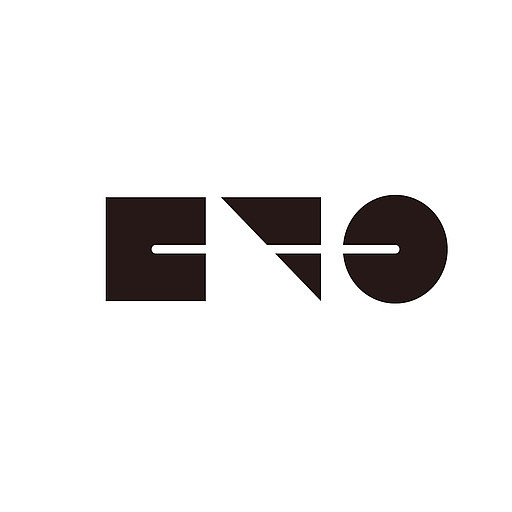
![▲ 필자의 다른 글 보기 [이미지 클릭]](https://cdn.maily.so/202301/cff4every1/1674824649090388.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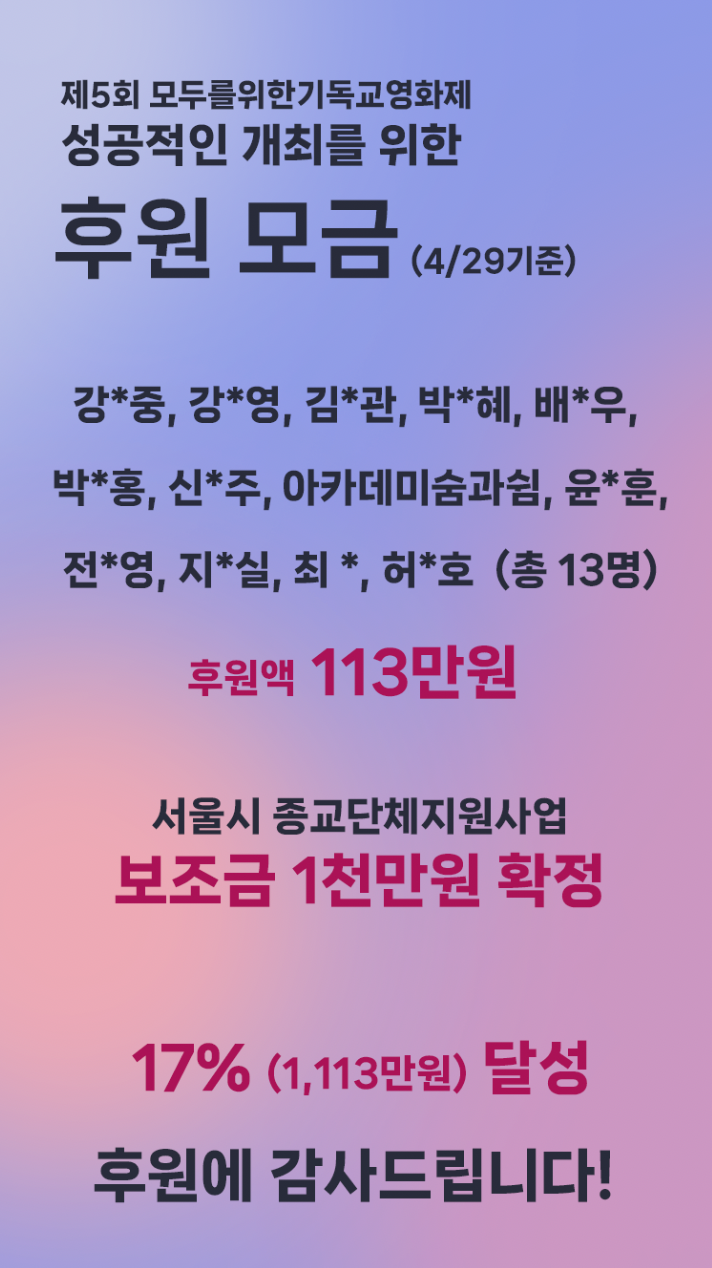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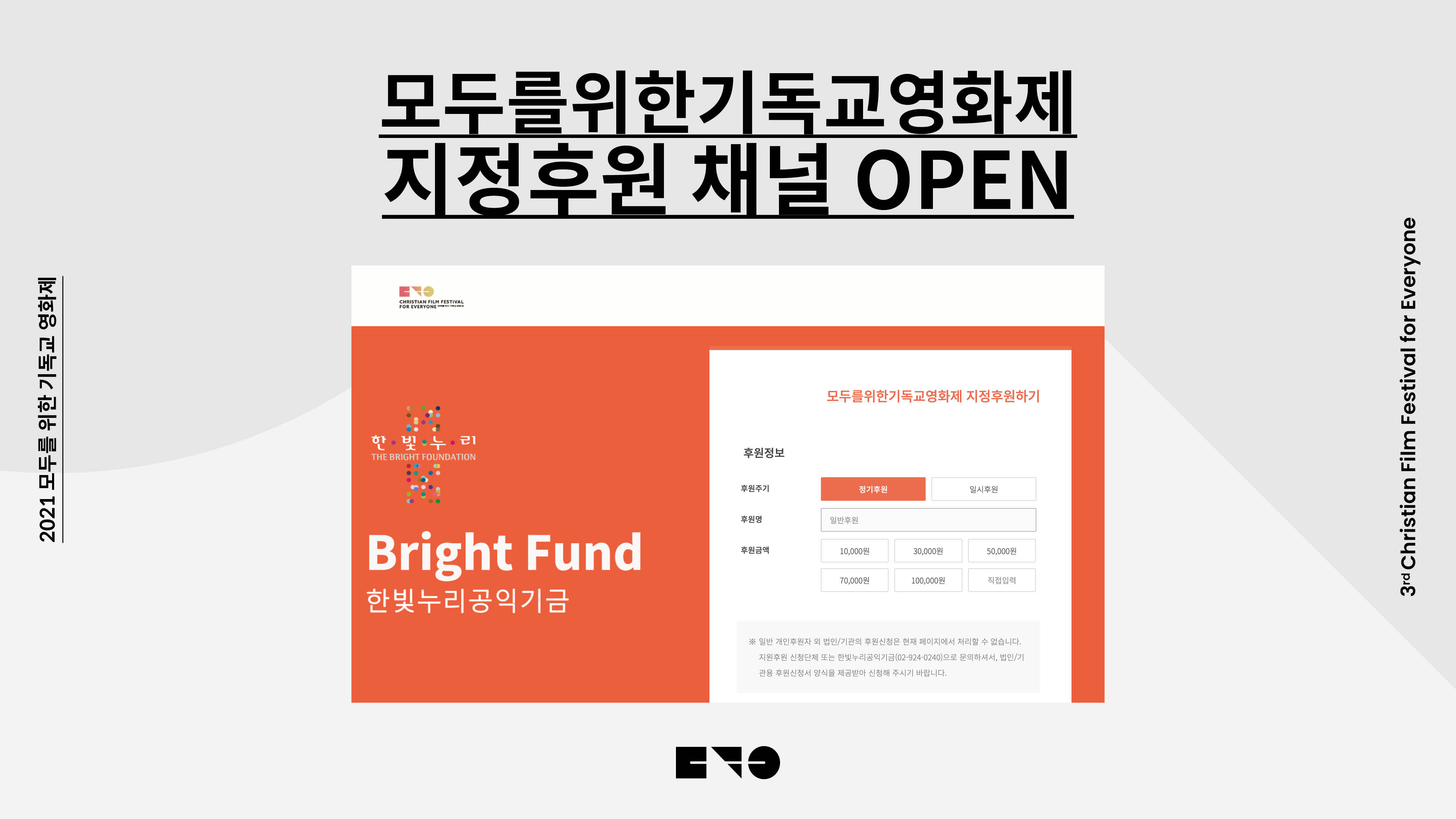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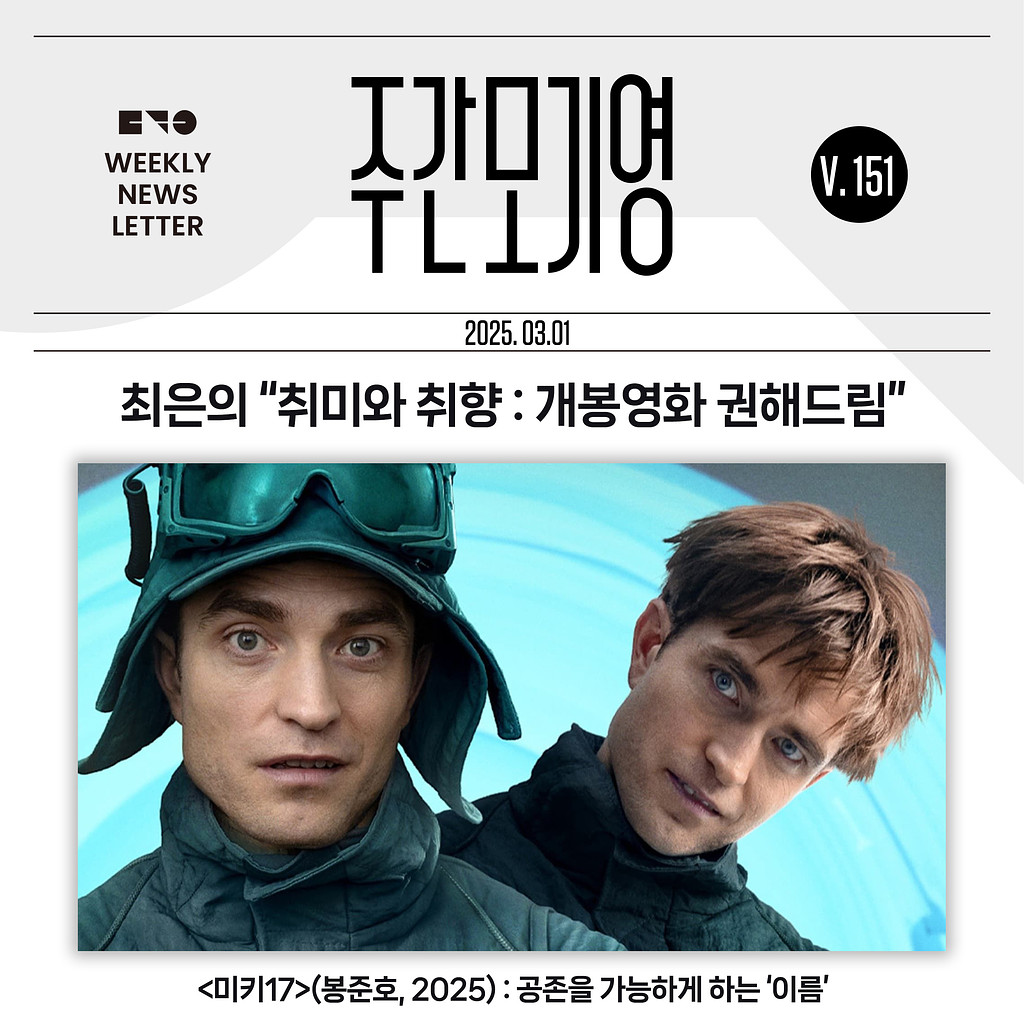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