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하는 장보기
헬싱키에서는 마트에 들러 장을 보는 것 자체가 작은 모험에 가까웠다. 간간이 번역기를 돌려 이 세련된 패키지가 뭘 담고 있는 건지 확인하다가 잠깐의 버퍼링 후 엉터리 답변을 내놓아도 그러려니 했다. 그마저도 번거로워 번역 어플도 사용하지 않고 우연에 맡기는 날들이 늘었다. 내가 산 맥주가 어떤 맛인지 꼭 알아야 하나. 재료나 맛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장바구니를 채우는 경험은 말이 통하지 않은 여행자만 누릴 수 있는 뜻밖의 행운일 테니 마음껏 누려야지. 이 생소한 쇼핑은 갈수록 대범해졌다.
한국에서는 똑똑한 소비자로 살기 위해 핸드폰에 매달려있던 시간이 꽤 길었다. 요즘 유명하다는 치즈부터 없어서 못 산다는 버터, 꼭 한번 먹어볼 만하다는 신메뉴 치킨과 놓칠 수 없는 세일 세일 세일. 하지만 여기서는 얼마든지 한심한 소비자가 되어도 괜찮지. 수십 가지 요거트 앞에서 나는 헬싱키 최고의 요거트를 찾겠다는 의지를 잃고 그저 작고 귀여운 그림에 내 운에 맡겼다.
숙소 근처 마트는 나에게 프리마켓 버금가는 행복을 선사했다. 물가 비싼 헬싱키에서도 외식보다는 장을 봐서 요리해 먹는 편이 훨씬 저렴했다. 그람 수 대로 담아주는 곳에서는 시스템을 알지 못해 담아주는 대로 받아왔다. 직원이 뭔가 물어보면 사람 좋은 웃음으로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많이 주시면 다음 날까지 먹으면 되고, 적으면 다른 것을 곁이면 될 일이다.
하루를 마감하고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러 신선한 채소와 과일, 와인 한 병과 재미있어 보이는 과자 몇 개를 고르면 하루치 행복이 가득 찼다.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도 실패가 두려워 항상 같은 맛만 먹던 내가 재미있어 보이는 과자라니. 난생처음 봤다는 이유로 신기하게 생긴 초콜릿을 고르다니.
여행은 이토록 사람을 다른 쪽으로 돌려세우는구나. 나는 헬싱키라는 도시에서 지금껏 한 번도 바라본 적 없는 삶의 이면의 여행 중이었다.
<무정형의 삶>에서 김민철 작가는 여행자를 ‘오해로 단단히 무장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나는 헬싱키 마트를 미지의 즐거움이 가득한 꿈과 상상의 나라로 오해하기로 한다. 그리고 내 작은 주방에 들어가서 나만의 만찬을 즐겨 보자.
저녁에는 냉장고에 나란히 세워둔 캔 맥주를 마실까 순전히 라벨이 예뻐 구입한 와인을 마실까 잠깐 고민했다. 겁이 많은 사람의 밤에는 적당한 취기가 필요한 법이니까. 숙취로 반 나절을 누워있기라도 하면 곤란하니까 내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셔야지. 낮에는 카페인 때문에 하루 한 잔의 커피를 공들여 고르고 저녁에도 두려움을 쫓을 정도의 가벼운 술자리만 준비한다.
술친구가 되어줄 유튜브를 틀어놓고 간간이 창밖에 그다지 어두워지지 않는 백야의 밤을 바라보며 보내는 저녁시간. 헬싱키의 여름 밤은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전까지 뜨개질 혹은 글쓰기로 이어진다.
겨우 며칠 만에 Minna의 여행자 아파트는 내 안락한 우주가 되었다. 이제는 익숙해진 동네를 지나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와, 집이다 안심한다. 숙소로 옮긴 첫날 문 여는 법을 몰라 몇 번이고 메시지를 주고받다 북유럽, 열쇠, 문 여는 법을 검색해 찾은 어느 친절한 블로거 덕에 들어왔던 진땀 나는 에피소드도 전생 같다. 엘리베이터가 없나 보다 당연하게 계단으로 캐리어를 끌고 올라왔던 건 또 어떻고. 3층까지 다 올라오고 나서야 방문과 똑같이 생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던 건 코미디가 따로 없는 추억이다.
주방이 없는 곳에서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다. 어린아이와 여행을 갈 때는 이른 아침이고, 늦은 밤이고 엄마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배가 고프다는 아이의 말이 떨어지면 바로 응급상황이 되었다. 엄마라면 배고프다고 짹짹거리는 둥지 안 솜뭉치의 입속에 뭐라도 넣어줘야 했다. 그때부터였나 나는 주방이 있는 집에서 머물길 좋아했다. 칼과 도마, 냄비와 가스레인지가 있으면 마음이 놓였다. 탈 나지 않는 좋은 것을 내 손으로 만들어 먹이는 기쁨은 내 아이의 성장이자 곧 내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했다.
아침이면 계란 한 알이나 두알을 끓는 물에 삶고 뿌리가 달린 잎채소를 손질했다. 그리고 방물 토마토 몇 알. 순전히 시각적 호강을 위해 어제 마트에서 선명한 초록 줄기가 달린 그림 같은 녀석으로 골랐었다. 소스는 숙소에 있는 올리브유와 소금이면 끝. 가벼운 샐러드를 곁들인 아침을 식탁 위에 차려놓으면 여행지에서도 나를 잘 먹이고 있다는 사실에 평안해진다. 휘둘리지 않고 나는 여기에서도 나를 잘 돌보고 있구나. 그건 이 작고 아름다운 주방과 숙소 앞 마트 덕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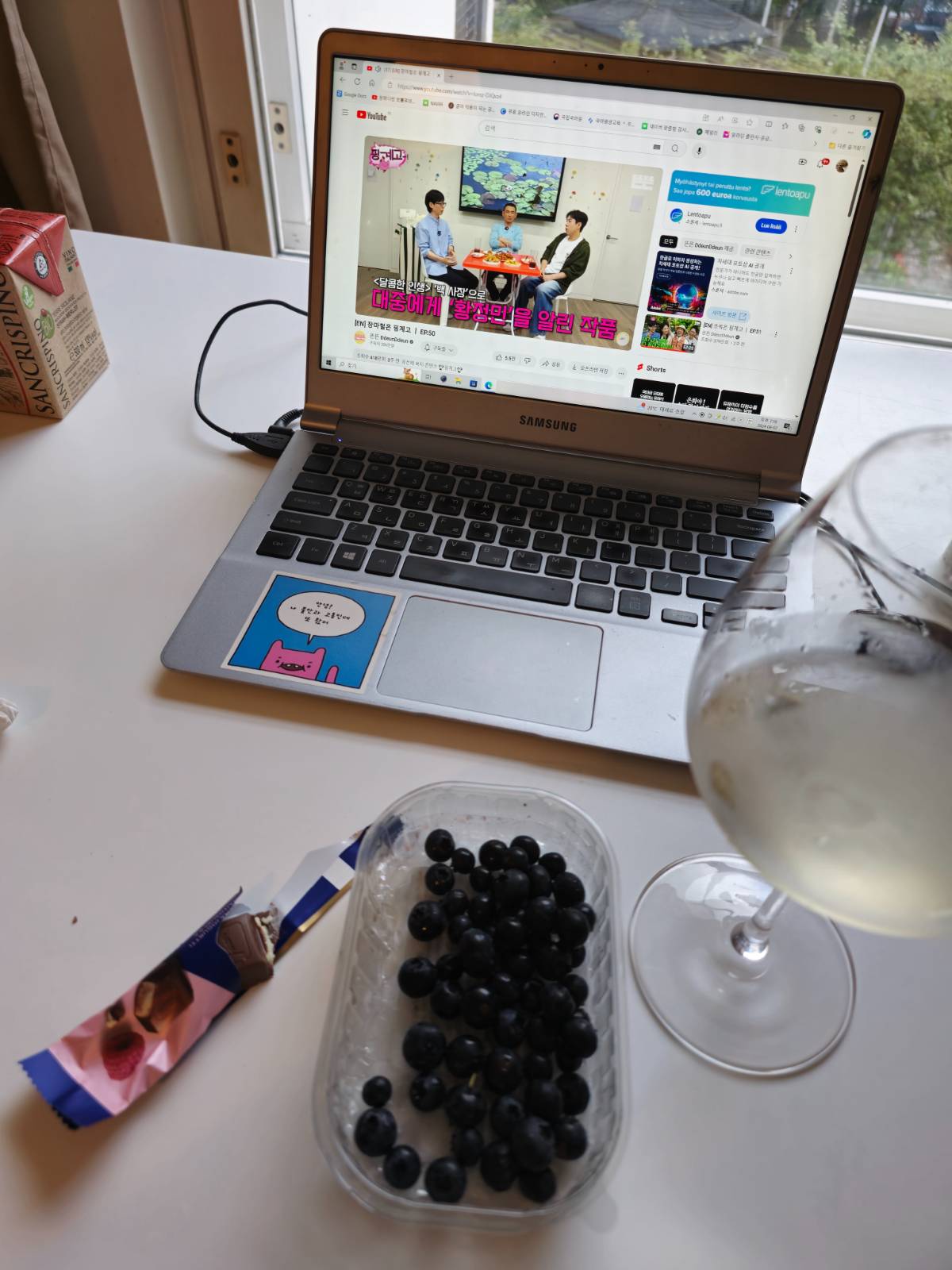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희정입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라니요. 즐겁게 장 보던 헬싱키의 날들에 대해 보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맛있다고 열심히 먹었던 블루베리 주스는 블루베리 죽이라고 해요. 베리류를 죽으로 먹을 수 있다니 너무 모험을 즐겼던 덕분에 헬싱키에서 흔한 아침 메뉴라는 것을 올랐네요. 전 그것도 모르고 요거트에도 넣어 먹고 맥주에도 섞어먹었어요. 모를 땐 참 맛만 있었다죠.
그럼 12월에 또 편지할게요.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2025. 11. 30.
희정 드림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