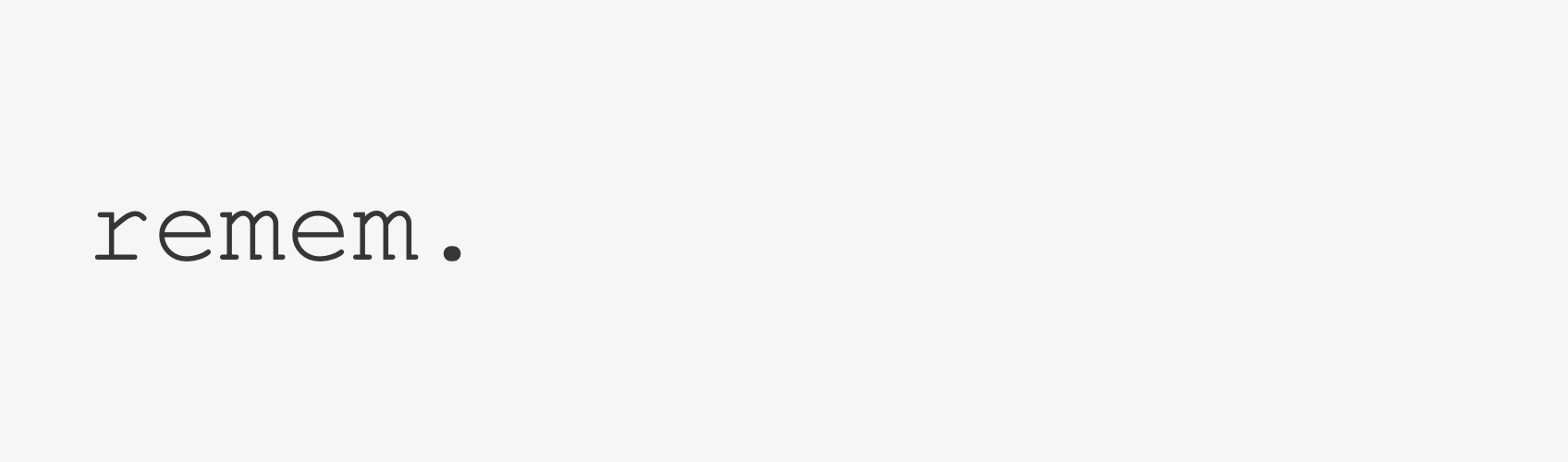
#
산사에서 만난 어느 스님과 나눈 이야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헛웃음이 난다. 이제는 이름도 법명도 기억나지 않는 젊은 스님의 대화법은 독특했다. 시도 때도 없이 두꺼운 책을 끼고 잠에 드는 중생이 세속의 피로와 불안을 호소하면, 스님은 그게 헛된 집착이라며 꾸짖는 대신 오늘날의 스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푸념조로 말했다. 특히 ‘훤칠하고 독경도 잘하시는’ 스님들을 부러워할 때면, 그의 투박한 용모와 살짝 하이톤의 목소리 때문에 어리석은 중생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절집도 보기에 예쁘다 뿐이지, 마음이 시장통이면 여기도 시장통이에요. 근데 시장통에 살아도 마음이 절집이면 절집에 사는 거고. 저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
“엄마, 나 중1 때 학원 끝까지 보내지 그랬어.”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강북의 대치동’ 같은 동네가 있어서 몇 개월 보낸 적이 있었다. 매일 밤 11시에 들어오고, 저녁은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것은 기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네가 너무 안 행복해 보였어.”
“엄마,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 안 행복해. 공부 기초가 잡히고 안 행복한 애들하고 나처럼 기초도 없이 안 행복한 애들로 나뉘는 것뿐이야.” 머릿속에 공이 울렸다. 뎅~!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