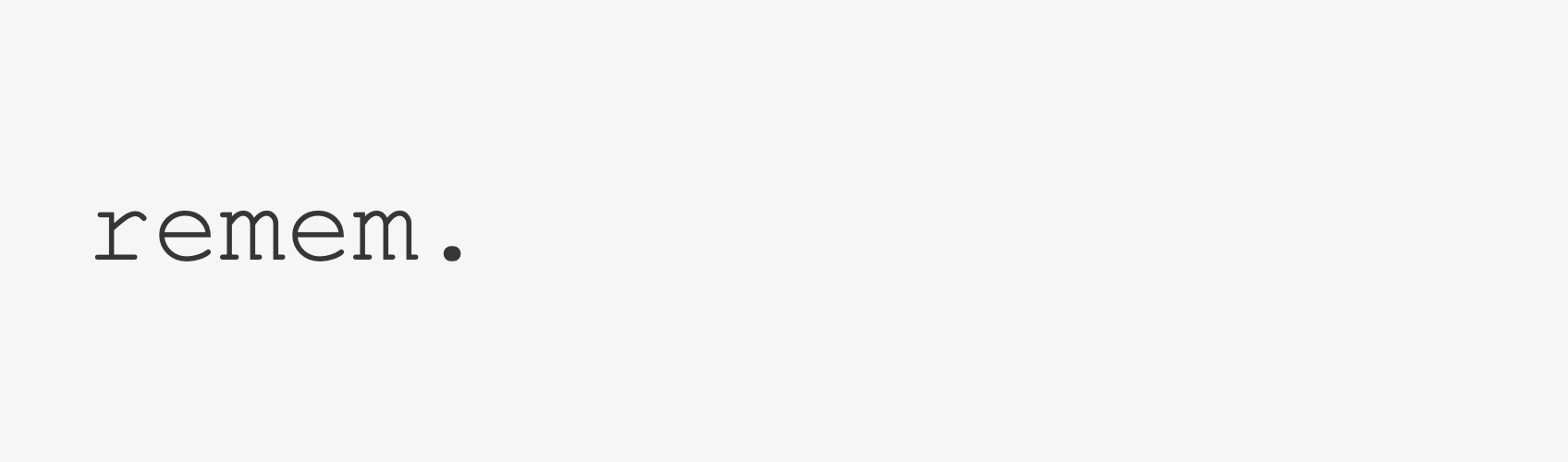
#
글 쓰는 영국 의사 헨리 마시의 <참 괜찮은 죽음>에는 어머니의 마지막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20년 전 치료받았던 유방암이 간으로 전이돼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죽음을 맞기로 결정한 곳은 40년을 지내온 아름답고 포근한 침실이었다. 벽난로 선반에는 어머니가 수집해온 작은 장식품들이 놓여있고, 크고 높다란 창문으로는 주일마다 다녔던 교회와 나무들이 내려다보이는 방. 아침저녁으로 작가 본인과 간호사인 누이가 어머니를 보살피며 간호하면서 죽음을 준비했다. 그렇게 몇주일동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맑은 정신으로 죽음의 과정을 걸은 어머니는 마지막에 모국어인 독일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멋진 삶이었어. 우리는 할 일을 다했어.”
#
어느샌가 계절의 흐름은 숫자에 가려버렸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낱장이 된 달력을 만난 그제서야 그날과 한 발 더 멀어졌음을 실감하면서
그렇게 너와는 영영 멀어지기만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데
그렇다면 일부러 나를 지나쳐가는 걸까
어디로 가기에 서두르는지
나는, 여전히…
—윤하, <스물다섯, 스물하나>
#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의 강 위에
떠내려 가는 건 한 다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 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언제 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 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이상은, 언젠가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