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 quite my tempo!”(템포가 안 맞잖아!)
영화 위플래쉬의 첫 연습 장면. 반복되는 드럼 소리, 이어지는 정적, 그리고 무언가가 던져지는 소리. 지휘자인 플래처는 신입생 네이먼에게 폭언을 퍼붓고, 뺨까지 때린다. 관객은 금세 불편함을 느낀다. 필자 역시 그랬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지?” 차라리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면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하지만 네이먼은 나가지 않는다. 무너지는 대신, 더 집요해진다. 그 독설은 그의 독기를 깨운다. 어떤 사람은 독설을 견디지 못하고 꺾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먹고 자란다. 필자는 네이먼의 그 상반된 모습에서 이상하리만치 눈을 뗄 수 없었다.
여기까지가 위플래쉬의 단편 버전이다. 장편 제작을 위한 투자 유치용으로 만든 이 단편은 선댄스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장편화의 발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영화는 아카데미 3관왕이라는 성과를 얻는다. 그런데 왜 가장 인상 깊었던 ‘손에 피가 나도록 드럼을 치는 장면’이 아니라, 이 첫 연습 장면을 단편으로 택했을까?
그 이유를 ‘기억에 남을 충격’이라고 본다. 단 몇 분의 짧은 연습 장면만으로도 인물의 성격, 영화의 결, 음악이라는 테마까지 모두 담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장면보다 더한 장면은 뭐지?”라는 기대감도 만들어낸다. 이 단편 하나만으로 전체 이야기가 궁금해졌고, 결국 장편까지 찾아보게 되었다. 단편이 가진 힘에 새삼 놀랐다. 짧기에 더 강한 몰입, 짧기에 더 강한 정서. 그 안에 열정의 시발점이 있었다.


그런 네이먼을 보며 문득 나 자신을 떠올렸다. 나는 이토록 하나에 미쳐본 적이 있었던가? 피가 날 정도로, 밤을 새울 정도로, 쓰러질 때까지?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그때는 그랬다. 목숨을 걸고 요리(전공)를 했었다. 밤을 새며 공부를 했고, 몸이 아파야지만 열심히 살고 있다고 느꼈었다. 그러나 요즘,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했잖아’라는 말로 나를 자주 용서해줬고, 쉬어가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 쉬기만 한 거 같아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쓰기로 했다. 브런치에 새로운 글을 쓰며 작가로서의 다양한 자질을 키워보려 한다. 목표를 구체화하고, ‘글을 쓴다는 것’의 무게를 다시 다잡아 본다. 필자는 이제 다시 미쳐보려고 한다. 글을 쓰는 것에.
💡 오늘의 사유하기
독자는 지금 무엇에 미쳐있는가?
이번 주 겨르로이 글은 어땠나요? 독자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이야기 하고 싶은 주제 추천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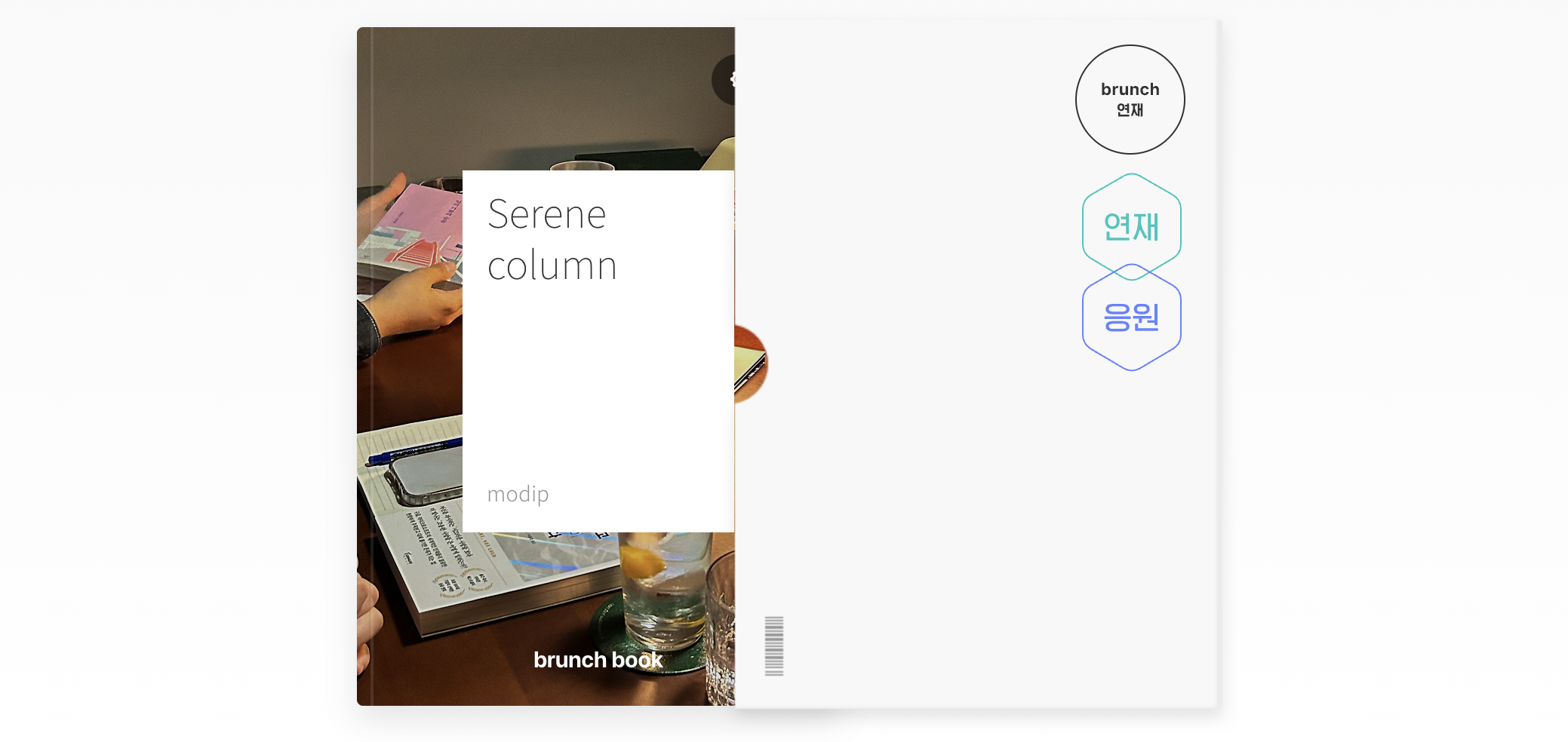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