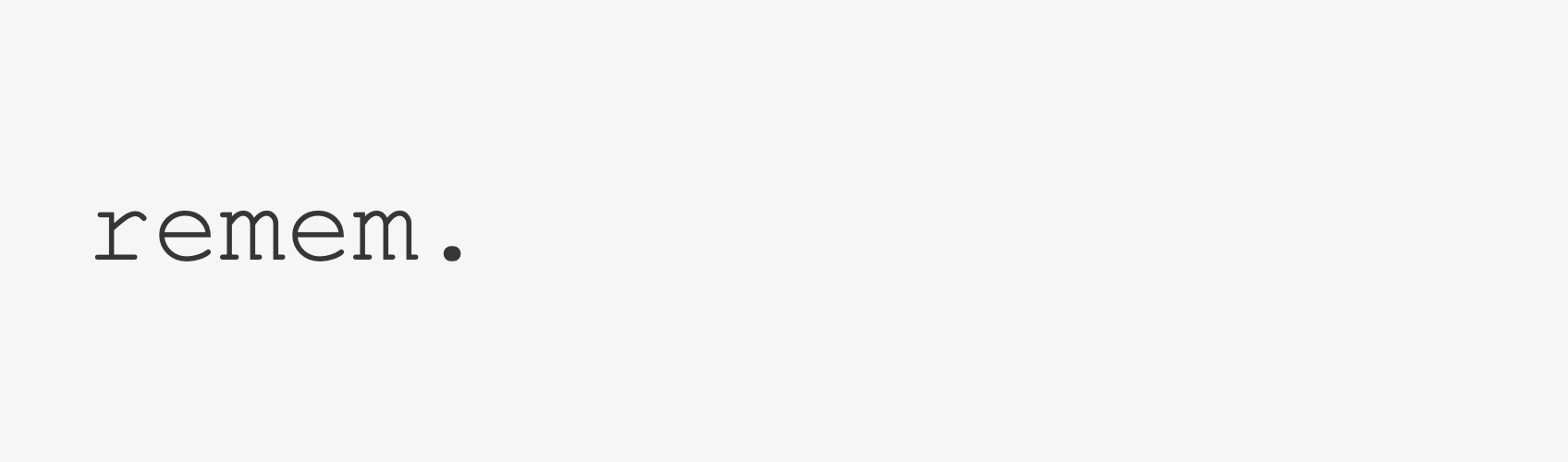
# 우리는 왜 그리스·로마 조각이 무조건 희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
1980년대 초반 독일 뮌헨대학교 고고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빈첸츠 브링크만은 그리스 조각가들이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 도구들을 주제로 논문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자외선을 비춰 표면의 상태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특수 기구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조명을 비추자 다양한 색을 칠한 흔적이 뚜렷하게 발견됐습니다. 깜짝 놀란 브링크만은 특수 조명으로 다른 조각상들을 비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대부분의 조각상에 색을 칠한 흔적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에겐 이제 조명 없이 맨눈으로도 색칠 자국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브링크만이 갑자기 초능력을 얻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저 눈을 가리고 있던 편견이 사라졌을 뿐인데,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오해의 대표적 예로 교도소 수용자 인권을 증진하면 교도관 인권이 나빠진다는 인식인데요. 교도소의 인권 수준이 높아지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권 수준도 저절로 높아지고 일에 권위가 생기며 좋은 직장이 되기 마련입니다. 환경을 개선해 ‘인권 파이’를 키워야 하는 겁니다. 학생인권을 부각한다고 교권이 침해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는 그에 맞는 해법을 모색하면서 교사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을’끼리 경쟁하는 프레임이 되면, 제일 편한 것은 비용을 들여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관료들이에요. 일을 안 해도 되니까요.
수전 손택은 <타인의 고통>에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누군가의 고통과 연계돼 있을 수 있음을 떠올려보라고 했지요. 인권감수성은 그걸 생각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밥상의 농산물을 마주할 때 농촌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거주와 임금 문제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는 것처럼요. 인권은 멀리 있는 거창한 명제보다 가까이의 타인을 헤아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