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끝나가는 걸 체감하는 시기에 공포영화 이야기를 꺼내 줘서 무척 반가웠어. 아니 벌써 쌀쌀하기까지 하더라고. 거리에서 들은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라는 말이 참 새삼스러웠어. 여하튼 무엇보다 환절기 건강 조심해!
나는 이번 편지로 네가 공포 소재를 좋아한다는 걸 제대로 알았어. 요즘은 좀 식었다만 나도 무서운 게 딱 좋거든. 아무래도 우리 다 겁을 내는 사람이라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어. 한껏 몰입해서 잔뜩 긴장하고 힘껏 놀랄 때 공포영화는 제 맛이 나니까. 눈을 가리고 고개를 돌리면서도 스크린 앞으로 계속 찾아가게 되는 모순적 즐거움!
NATE 버튼을 눌러 무서운 이야기를 봤다던 너의 편지를 읽고, 폴더폰 시절 한창 무료게임타운(일명 무게타)에서 공포 글을 찾아봤던 시절이 떠올라버렸어. 혹시 너도 무게타를 아니...? 그렇게 괴담을 찾아 읽으면서도 밤이 되면 덜덜 떨었던 과거의 나... 아! 그리고 질문에 답하자면 내가 극장에서 첫 번째로 본 공포 영화는 아마 <고사: 피의 중간고사>일 거야. 추억이지.
지금은 많이 무뎌져서 그때처럼 공포를 만끽하진 못하지만, 여전히 공포영화는 좋아해. 이젠 공포영화라는 장르 자체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요새 그렇게 <놉>이 재밌단 평이 많더라고! 그런 평 보고 나면 어떨지 너무 궁금해지잖아. 그래서 보고 왔지, 조던 필의 신작 <놉>. 그럼 당신이 스포를 좋아한다니 은은히 스포 섞은 후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자꾸 놀라게 하면서 도파민 자극에 치중하는 ‘공포’ 영화. 근데 <놉>은 공포 ‘영화’였어.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영화’가 중요한 영화야.
또 <놉>은 UFO(영화에 “요즘은 UFO(미확인 비행 물체)가 아니라 UAP(미확인 항공 현상)으로 부른다”는 대사가 있지만 입에 안 붙어서 UFO라 칭할게) 영화이자 크리쳐물이기도 해.
<놉>의 주인공은 OJ 헤이우드(다니엘 칼루야)와 에메랄드 헤이우드(케케 파머). 이 남매의 가문은 할리우드 인근 아과둘세에서 헤이우드 말 목장을 대대로 운영하고 있어. 나름 평화롭던 어느 날, 말을 타고 있던 아버지가 하늘에서 떨어진 무언가에 맞아 숨을 거두게 돼. 아버지에게 치명상을 입힌 건 바로 동전. 이 사건 이후, 이들은 자신의 집 위에 UFO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지.

저 하늘에 원반 같은 게 떠 있는데 엄청 큰데 또 엄청 빨라. 가장 큰 문제는 걔가 뭐든지 다 흡입한다는 거야. 흡입하듯이 먹고 소화도 시켜. 물론 사람도. 근데 저 원반 같은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계인이 조종하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인 거지.
<놉>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괴)생물체를 대하는 태도/방식이었어. 너는 너희 집 주변에 UFO처럼 생긴 게 날아다니면 어떨 것 같아? 영화 속 인물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해. “괴생물체? 저건 찍어야지!” 그리고 “괴생물체도 생물이잖아요!”.
(참고로 영화에서 OJ는 ‘이름 붙일 수 없는 UFO처럼 생긴 어떤 것’에 진 재킷이라는 이름을 붙여. 이 편지에서도 이를 진 재킷이라 칭할게.)
솔직히 진 재킷이 자기 머리 위에 나타났을 때, 21세기 현대인 중 대부분이 핸드폰 들어서 촬영하고 있지 않을까. 서울에 나타났다면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괴생물체 사진으로 넘쳐났을 듯 해.
동생 에메랄드도 자신의 집 주변에 UFO 같은 것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오히려 좋아해. 이걸 찍어서 출세의 기회로 삼겠다는 거지. 제대로 찍으면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며 집에 CCTV도 설치해 둬. 이들은 어떻게든 진 재킷을 찍기 위해 자신의 눈과 더불어 카메라의 눈을 적극 활용해.

진 재킷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헤이우드 남매뿐만이 아니야. 진 재킷 찍겠다고 촬영 감독도 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유튜버도 찾아오고. 헤이우드 목장은 광기 어린 촬영 현장이 되어버려. 헤이우드 목장 인근에서 ‘주피터 파크’를 운영하는 리키 주프 박(스티븐 연)은 심지어 진 재킷이 등장하는 쇼까지 벌여. 진 재킷이 가지고 있는 스펙터클을 팔아넘기려는 거지. 과연 이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 진 재킷이 사진 찍히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도 같거든.

영화를 보고 나면 ‘찍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 '사진이 없으면 없었던 일’이라는 말처럼 요즘은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 타인에게 보여지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 찍는 행위가 꼭 필요한 건가 봐. 신기한 대상을 찍고 싶어 하는 것은 일종의 정복욕, 소유욕인가 싶기도 해. 일상이 되어버린, 찍고 업로드하는 행위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 다시 곱씹게 되네.
두 번째 반응은 “괴생물체도 생물이잖아요!”라고 했는데, 진 재킷도 생물이기에 습성이 있을 것이고 길들이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접근이야. 이는 주인공 남매가 말 조련사라는 점에서 비롯된 시선일 듯싶어. 말을 길들였듯, OJ는 진 재킷을 파악해 길들이려 시도하지. OJ가 파악한 습성 중 하나는 진 재킷에 빨려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눈을 마주치지 마라! 진 재킷의 눈은 껍데기 안에 녹색으로 자리 잡고 있지. 이 눈과 길게 아이컨택하는 순간 뭐 잡아먹히는 거지. 눈을 마주치는 것은 서로를 인식하는 거니까.

<놉>에는 비인간동물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 진 재킷뿐 아니라 말, 그리고 고디 역의 침팬지까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해. 인간이 어떤 생물체를 완전히 길들일 수 있을까? 영화를 보고 내가 던진 대답은 회의적이야. 인간이 어떤 생물체를 온전히 길들일 수 있다는 건 ‘얘는 여기까지는 안 와’, ‘얘는 인간을 해치지 않아’라며 다 파악했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 싶어. 하지만 무지는 또 두려움을 불러오지. 무지와 오만 사이에서 우리는 다른 생명체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보게 되고. 되게 공포영화 후기스럽지 않은 마무리네.
새롭고도 영화적인 스펙터클을 찾는다면 <놉>을 추천할게. 보고 와서 같이 더 수다 떱시다!
P.S. 눈을 영타로 쓰면 SNS더라.
FRO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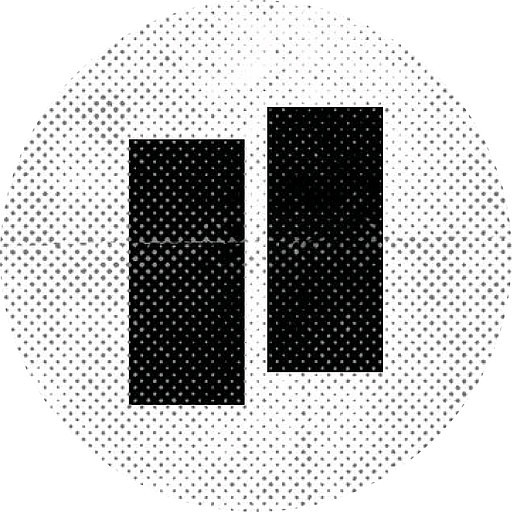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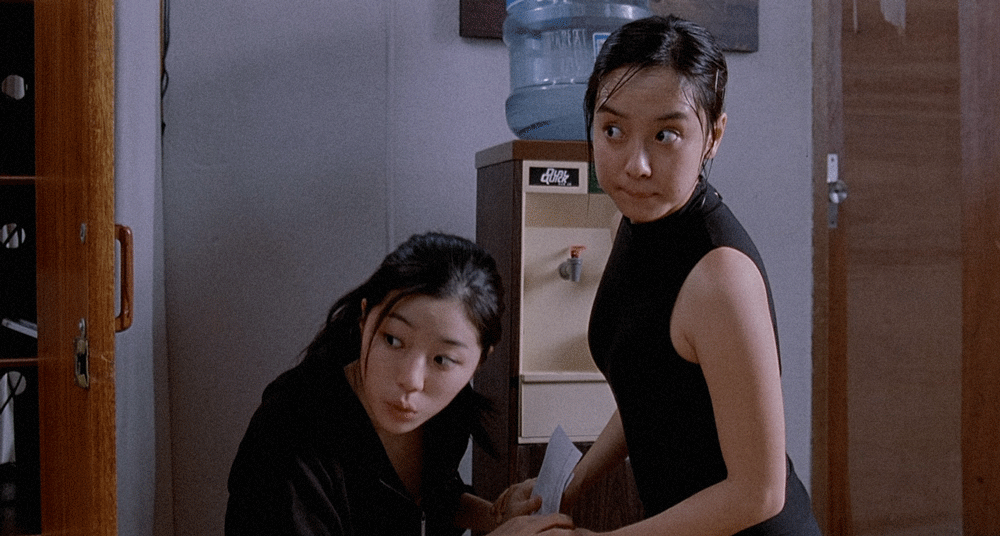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