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0월이 다 지나갔네. 날씨가 너무 휙휙 변해서, 매일 오늘 날씨는 어떨지 눈치를 보며 문을 열어. 지난번 메일에선 네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번엔 내가 꽤 오래 몸이 아팠어. 몸이 조금 낫고 나니, 밖에 나가 놀 순 없지만 인간이 또 재미를 찾기 시작하더라고. 그렇게 안 보던 TV 프로그램도 보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서늘한 지금만큼 책과 영화가 잘 들어오는 때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책 『영화 도둑 일기』도 읽었지. 정보의 바다(오랜만인 표현…)를 떠다니거나 파헤치며, 영화를 찾거나 던져 놓는 해적들의 이야기. 나는 영화를 향한 그들의 열망과 욕망에 공감이 되기보단, 경외감 혹은 의문이 들었어. 나는 늘 어중간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 마음이 도대체 어떤 건지 감각되지 않았거든. “이보다 더 값진 일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표현을 빌릴 정도라니. 그 헌신적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약 250편가량의 자막을 만들어 ‘씨네스트’에 업로드 하는 umma55님도 그렇고, 세계를 다니며 아무도 보지 못한 영화 필름을 영사 신청하여 보러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단지 취미라며 이 책을 쓴 사람도 그렇고. 필자 및 인터뷰이들 또한 그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자신들과 같이 ‘해적’이 될 만큼의 사람을 구별하는 것 같기도 해. 이 책을 보다보면… 나 그리 영화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적이 될 때… 비로소 시네필이 되는 거겠지?
나도 영화를 좋아한다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하듯 이 책에 당연스레 나오는 이름들(페드로 코스타, 프레스턴 스터지스,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등…)을 꿰고 있다거나 마이너한 영화들을 디깅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 영화에 대한 수집욕은 더더욱 없어. 오히려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미지와 사운드가 시간과 함께 흘러간다는 점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느껴. 물론 같은 영화더라도 스트리밍과 영화관의 경험은 이미 분리된 영역이 된 것 같긴 하지만.
『영화 도둑 일기』에 등장하는 아린담 센(독립 큐레이터이자 평론가)은 “근데 정말로, 이제는 영화 링크만 봐도 넌더리가 나요. 실제 상영도 없고, 영사될 프린트도 없고, 아무도 영화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현 상황이 굳어진다면… 그냥, 시발 어딜 가든 링크밖에 안 보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 한편으론 내가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게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시네마테크와 영자원, 여러 독립예술영화관들이 있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해. 곳곳에 도서관이 있듯, 지역마다 영상자료원이 있어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있지만 그럴 수 없다면 해적질이 영화에 대한 접근성 및 보존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데 동의해.
지적재산권이란 없다. 창작자에게는 권리가 없다. 단지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장 뤽 고다르
네가 말했다시피 우린 ‘굿 다운로더’ 교육을 받고 자란 시대잖아? 하지만 살면서 ‘저작권을 무조건 지켜야 해!’라는 생각에 여러 갈래의 ‘하지만’이 생기는 것 같아. 지난 9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첫 영화로 마누엘 엠발스의 <새로운 폐허들>을 보았어.

사실 ‘프런티어’ 섹션에 있는, 1인칭 시점의 카메라로 멀미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실험영화를 상상하며 혼자 기대치를 낮추고 있었는데. 정말… 자신의 예상을 너무 믿어선 안 되는 것 같아. 근래 본 영화 중 가장 인상적이고 재미있고 또 통찰력 있는 영화였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활동하는 마누엘이 주위의 전자 쓰레기들을 수집하고, 고고학을 빌려 이 쓰레기들과 연결된 환경, 노동, 자본주의 등을 살피며 걸어나가.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고양이 ‘팬드라이브’가 참 귀엽답니다.)
“와 너무 좋다…” 하면서 보는데 엔딩에 이런 문구가 떠올랐어.
“사유재산은 범죄다”
왜 이 문구를 넣었을까 하는 궁금함에, 내 생애 두번째로 GV에서 질문도 해봤는데… 떠올리기로는 전자폐기물을 주우러 다니는 마누엘과 같은 수집가들 사이에서 주로 쓰이는 말로, 자본주의 사회에 반하는 기조라는 답변이 돌아왔던 것 같아. 생각하기로는 ‘사유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 것과 너의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건데, 사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잖아. 전자 폐기물만 하더라도 이를 돈을 주고 구매했던 이가 있고, 그 전엔 이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사용된 자연이 있을 거고, 또 땅에 버려져 이를 줍는 마누엘이 있고, 이를 보는 우리가 있고… 그런 연결을 잊게 한다는 데서 범죄라 말한 게 아닐까 싶어.
기억에 기반한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무튼 마누엘은 그 문구에 동의하며 자신의 창작물 또한 비영리에 한해 자유롭게 상영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말했던 걸로 기억해. 그걸 들으며, 모든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엄격한 저작권 규정을 내세우는 건 아님을,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보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느꼈던 것 같아. 『영화 도둑 일기』에도 자신의 작품을 카라가르가 사이트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올리는 감독 스콧 발리나, 자신의 SNS에 영화 파일을 올린 하모니 코린과 같은 감독이 등장하잖아.
저작권에 관해 이야기하다 보면 ‘굿 다운로드’를 넘어선 다양한 관점들이 보이는 것 처럼, 이 책을 보며 해적질 또한 영화라는 세계를 돌아가게 하는 사랑의 한 축임을 목격했어. 또 ‘아, 이렇게 하면 이런 영화를 볼 수 있구나’ 하는 일종의 실용서 역할도 한달까… 읽다보니 나도 저 틈에 껴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한껏 나눠주려는 듯한 영화 도둑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살짝? 시도해봤는데.. 해적질 나에겐 어렵더라…)
저자는 책의 목표에 대해 이렇게 말해.
아무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와 즐거움일 것이다… 사실 어딘가에 존재할 미래의 해적 동료를 구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동료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신이 이 책의 어딘가에서 그러한 재미를 찾고, 계속해서 일상적인 즐거움으로 영화를 본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나면 대다수의 시네필들이 사라진다는데… 심연의 시네필이 되진 못하더라도, 영화 보는 즐거움을 일상에 끼워 놓고 살아갈 수 있음 더할 나위 없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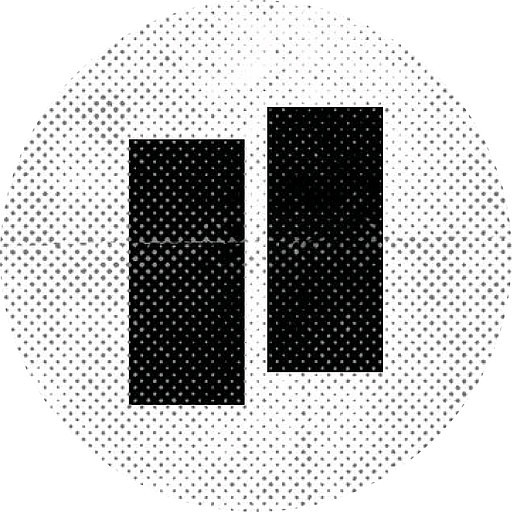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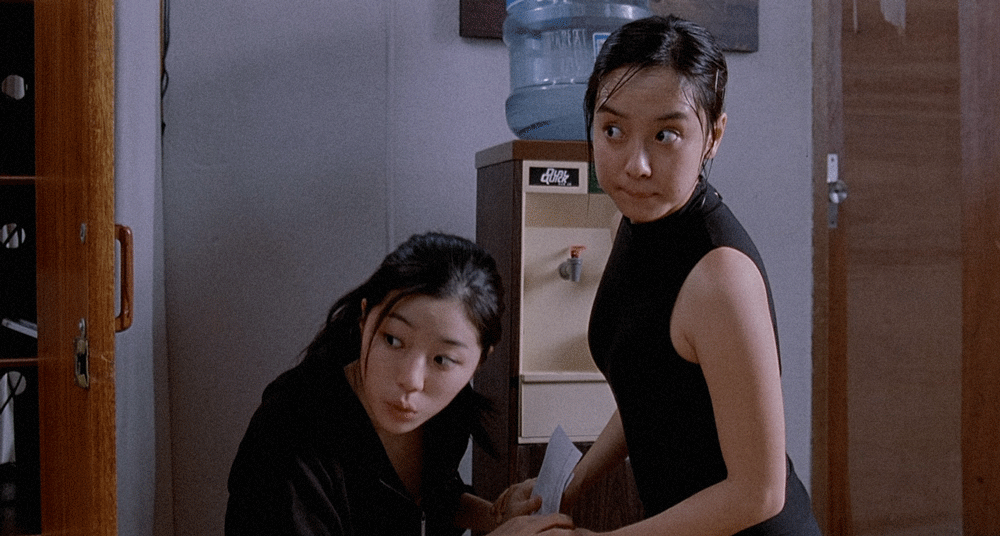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