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터도 창작자도
뉴스레터는 메일리에서
브랜드 마케터
구독자 그룹, 데이터 분석,
자동화로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개인 창작자
베이직은 월 1,000건 무료로
창작의 시작을 부담없게
검색 노출로 지속적인 성장
Google Lighthouse SEO 100점인 메일리는 검색엔진 최적화된 뉴스레터 블로그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통계와 데이터로 더
정확한 성과 측정
각 메일별 통계와 구독자별 통계를 활용하면 뉴스레터의 성과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GA, GTM 등의 외부 데이터 분석 도구를 연동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뉴스레터를
시작해보세요
🎉 새로운 뉴스레터
💌 추천 뉴스레터
🔥 인기있는 레터
8월 3주차 주요 뉴스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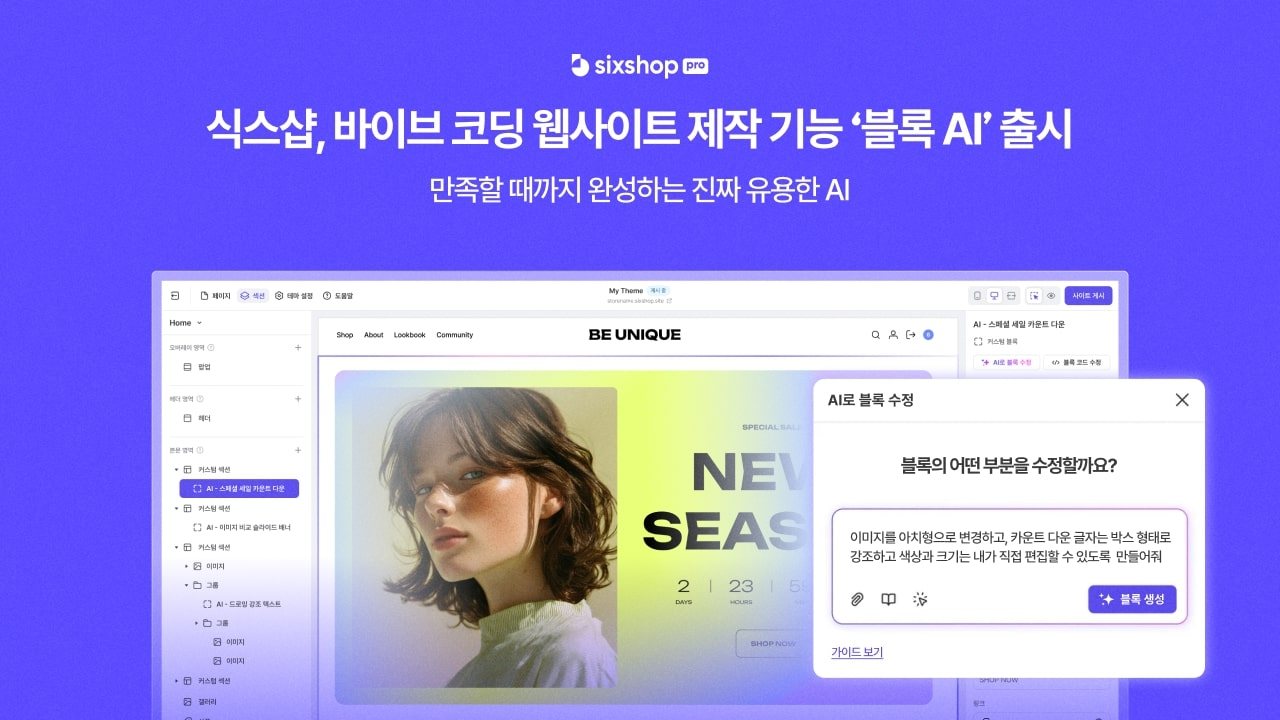
새롭게 만나는 웰니스 레터, 잼플 레터

구독자 님의 MPTI는? (오타 아님)

많아도 탈, 적어도 탈 '갑상선'

메일리 뉴스레터가 돌아왔어요.

👋 새로운 레터
유료 콘텐츠
Moist Notes

Notice
JDC는 구독자님의 성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주간 iQ 레터
+10%와 -10%는 같지 않다

What The App?
2025년 8월 22일, 43번째 왓더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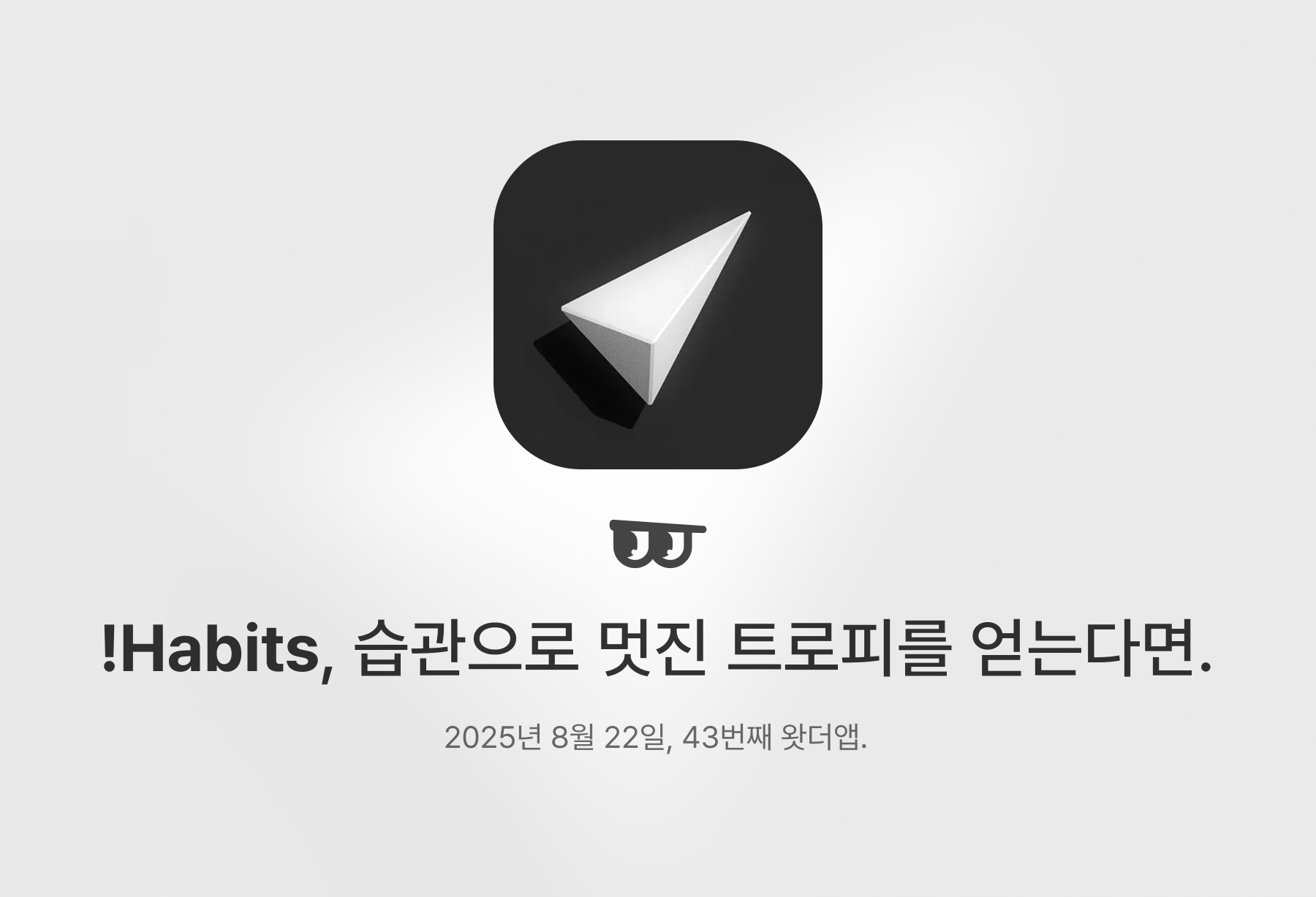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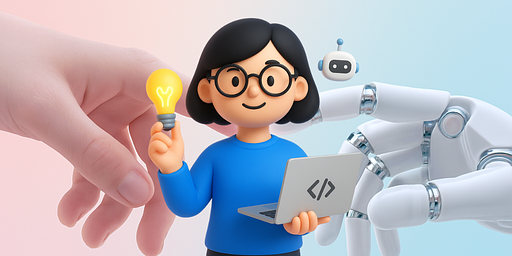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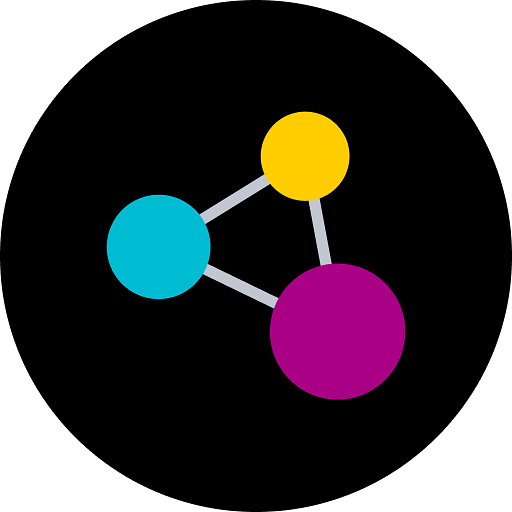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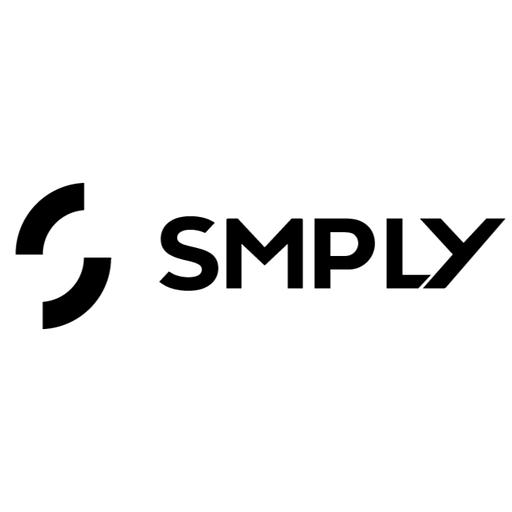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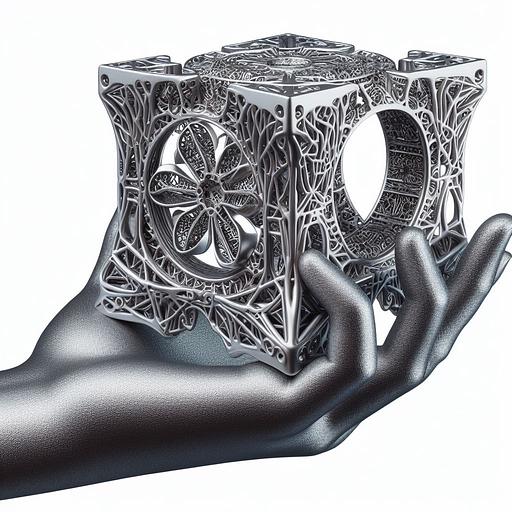
![[Maersk] ICS2 Phase 2 실시 관련 SI 접수 방법 안내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411/1731034354874374.jpeg)

![[헤비츠] 8.15 빛을 되찾다! | 최대 25% 회원쿠폰 + 선주문 20% + 신제품 당일 50% 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407/1719992616856197.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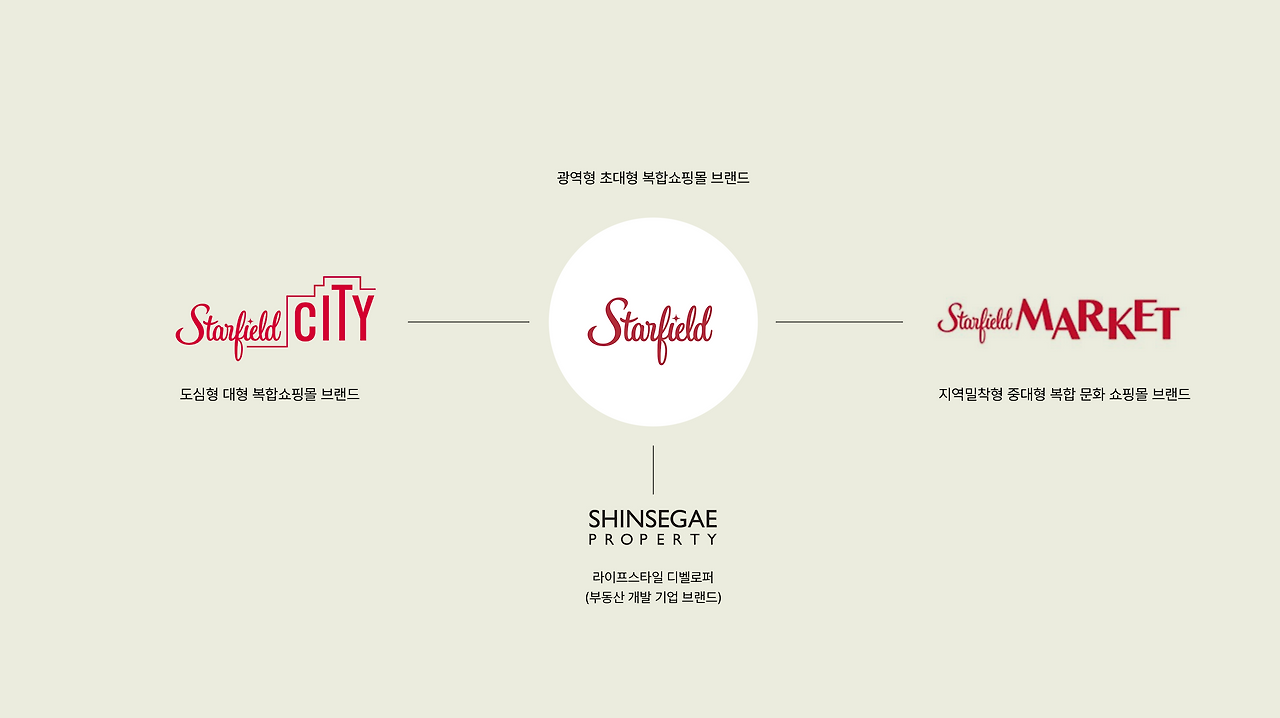
![📈 연 63% 성장하는 로봇 시장, 데이터는 준비되셨나요? [비즈니스.AI]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507/1753925316038267.png)
![[조직문화 탐구생활 #3] 3년 차 스타트업이 1위가 되기까지, 성과 중심 조직문화 설계법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508/1755578989347863.png)

![[은호레터]애플, 구글 제미니로 시리 개편 논의 / 트럼프 인텔 지분 10% 확보 / 오픈AI 최고인사책임자 사임 등 오늘의 경제 뉴스 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508/1755894299814666.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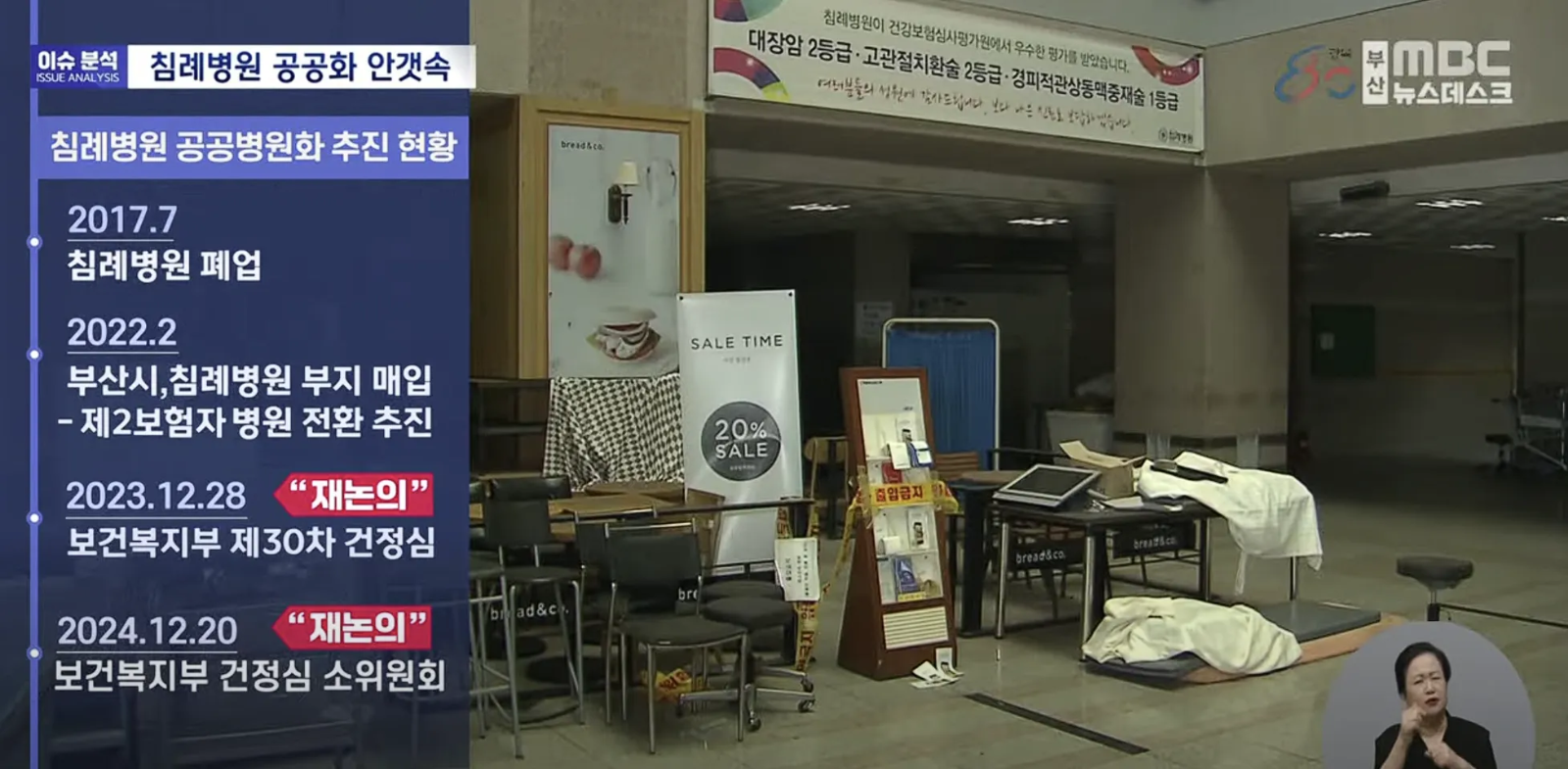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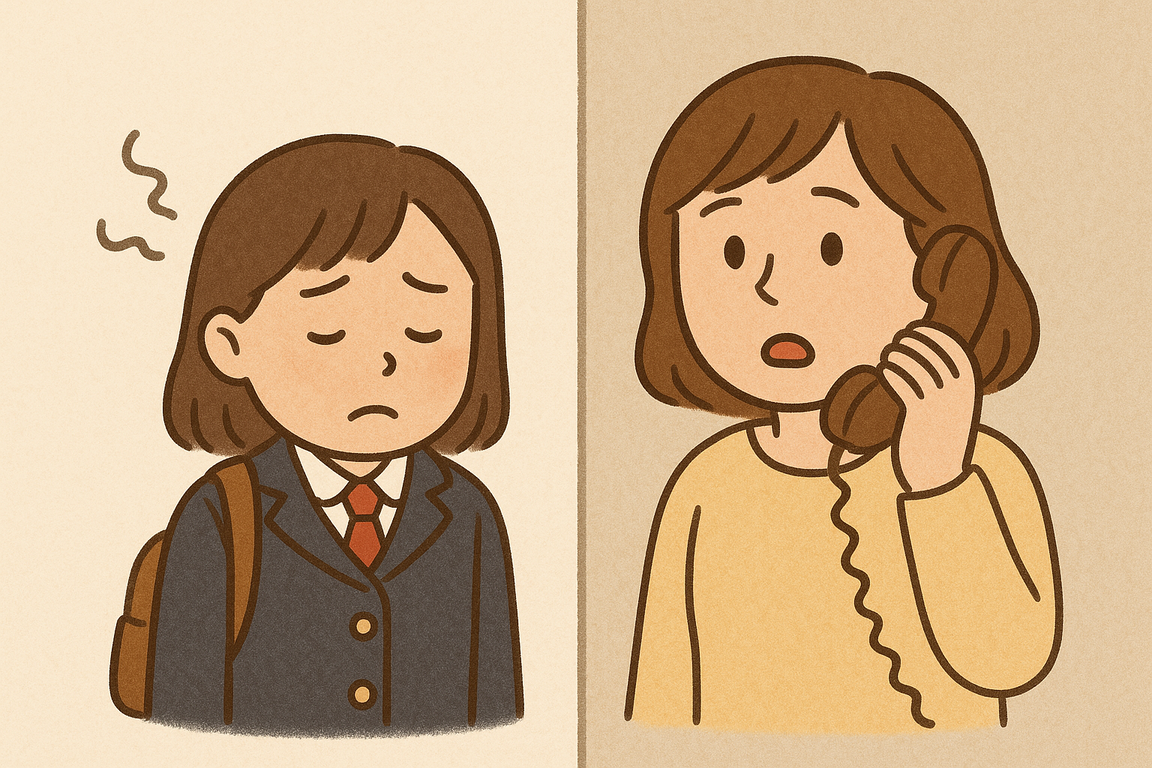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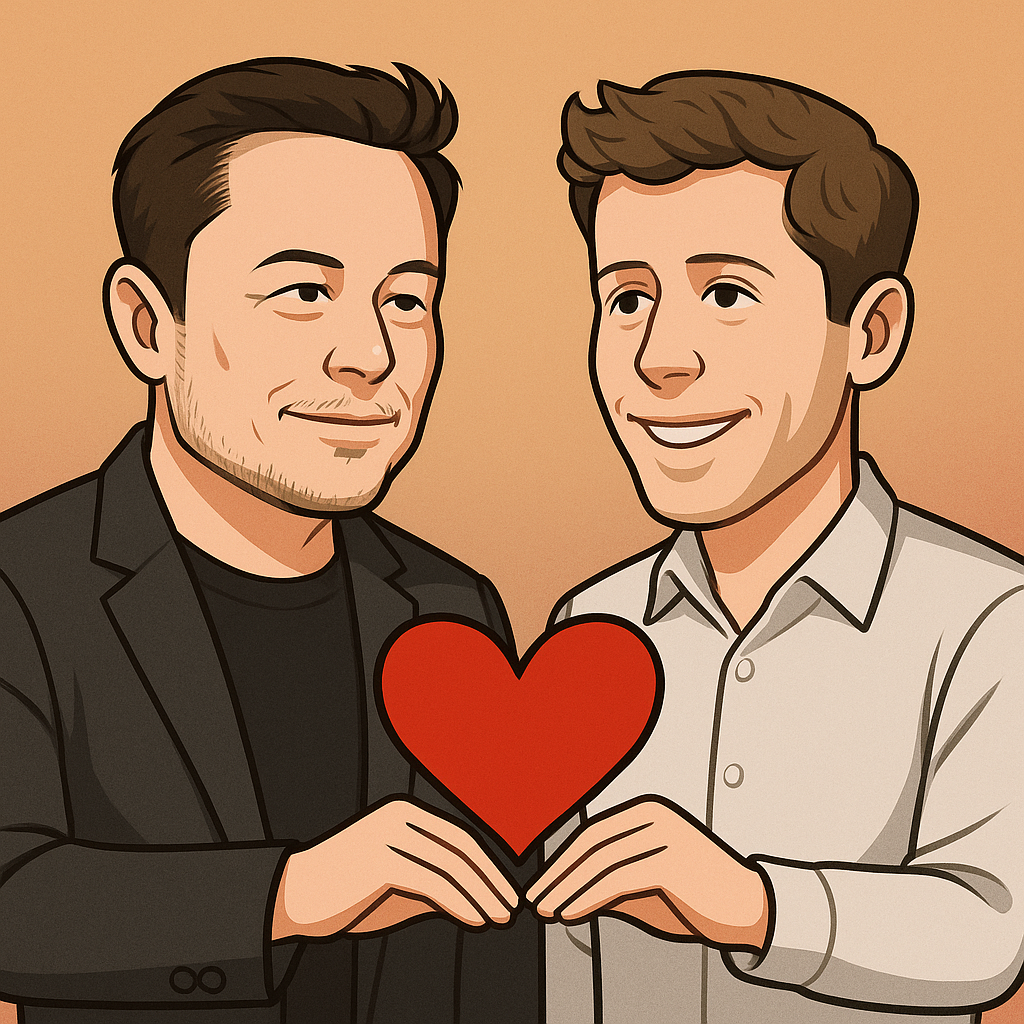

![[은호레터]팔란티어, 좋은 비즈니스와 좋은 가격 사이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508/175577238243119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