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오타를 발견하면 출판사에 메일을 보내 알려줬고, 대화 중에도 상대가 실수로 잘못 말하면 고쳐줬습니다. 개발자 시절, 누군가가 잘못 알고 있는 걸 발견하면 매뉴얼을 찾아서 짚어줬습니다. 제가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줄 알았죠. 오지랖이 넘쳐 알려주지 않으면 상대는 평생 모르고 살까 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상대에게 알려준 것인데, 뭔가 싸한 분위기가 감돌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대가 잘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더군요.
반면, 저의 사소한 실수는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남보다 두 배로 비난과 자책을 했습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몇 년 전 퇴근하고 대학원 수업을 들으러 학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앞자리 번호만 보고 버스를 탔어요. 몇 정거장 가다 보니 버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더군요. 바로 내려 택시를 타서 지각은 면했지만 멍청하고 꼼꼼하지 못한 저의 행동을 몇 달 동안 비난했습니다. 그 이후론 버스 번호를 꼭 한 번 더 확인하고 승차합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를 아직도 기억할 만큼 자책했습니다. (정말 피곤한 인생이지요.)
이메일을 보낼 때도 자주 실수합니다. 보낸 메일을 다시금 읽으며 얼굴을 붉힙니다. 보내기 전에 더 읽으면 될 일을, 늘 보내고 나서 다시 읽으며 후회합니다. 빨리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꼭 몇 번 더 읽어보는데 말이죠. 틀리면 안 된다는 신념, 빠르게 해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게 저를 옥죄어 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일은 오래전에 멈추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정신줄을 놓으면 본성으로 돌아가는 때가 가끔 있지만요. 또한 자책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이라는 건 없고 특히, 제 실수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경우가 많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보다 제 행동에 그닥 관심이 없으니까요. 제가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가더라고요. 그나마 블로그나 브런치는 발행한 글을 수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죠.
계속 자책을 줄이려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최근 실수를 하고도 아주 편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하며 얼른 수습하는 저를 알아차렸습니다. 내글빛에서 링크를 잘못 넣어 모르고 있다가, 문우가 알려줘서 고쳤고요. 나찾글에서 피드백 메모를 잘못 복사해서 엉뚱한 사람의 것을 넣어주었다가 제보로 고쳤어요. 예전 같으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도 벌렁거렸을 텐데요. 너무나도 평화로운 제가 뻔뻔스럽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인간미'라는 새로운 가면 아래 살짝 쉬어 갑니다.
뻔뻔스러운 게 아니라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 있는 그대로 저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를 저지르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타인이든 자신이든 실수 없이 성장은 없어요. 실수투성이 속에서 진주를 품어, 키워내고, 그 진주가 빛을 발할 때까지 오늘도 저는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타인이나 자신의 실수에 너그러운가요?
'일과삶의 주간 성찰' 뉴스레터 주변에 소개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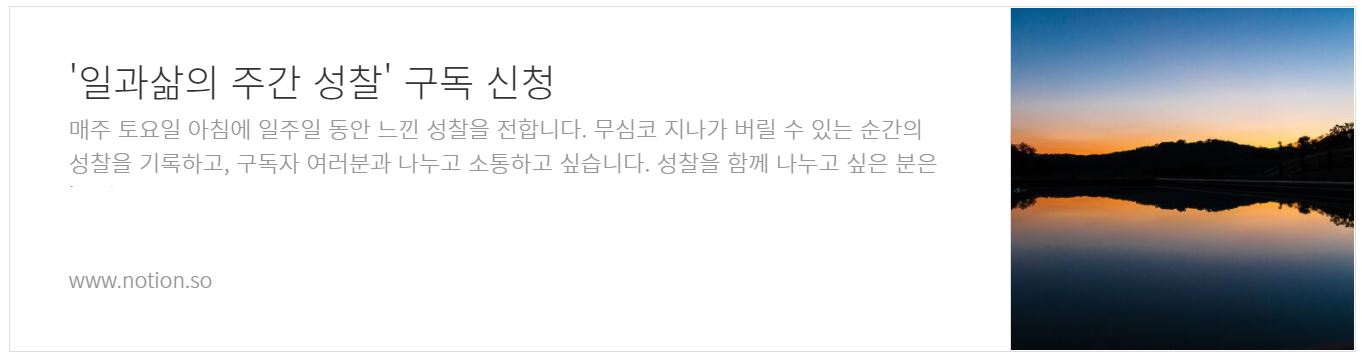
오늘 글은 어떠셨나요? 피드백을 댓글로 주세요.

![[일과삶]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는 마음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chea9006d2k5v4cjmd0oaqosc4au)
![[일과삶] 정년퇴직 후에도 영원한 현역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cacua2li70e1selyywm8yle0f4w7)
![[일과삶] 자원봉사와 기부에 전념하는 삶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wray9t1mb9fwcc442q0g2yjhr5iz)
![[일과삶] 가을 자락에서, 배우고 즐기며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49f25is8ca2tptbyuw8gaszzty6x)
![[일과삶] 아보하? 나사하!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jsijjxzga6mklyd6pfho721ok7aj)
![[일과삶] 위키드가 부린 마법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kn3rw7jf6kk6ypec2apfmk5lobt1)
![[일과삶] 아들이 만든 김치짜글이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o6autfx0w5vougi0cyj9x4e4i0qa)
![[일과삶] 2024년 일과삶의 10대 뉴스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w6io24xklyvtcrbh98iy681w78xf)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