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집에 한 번 갈게."
"그래 와라. 뭐 먹고 싶어? 추어탕집에서 만날까?"
"아니, 집에서 먹어. 내가 재료 가져갈게."
도대체 무슨 재료로 무엇을 만들겠다는 명확한 이야기도 없이, 집에서 밥을 먹겠다고 아들이 연락했습니다.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있나 보다 했습니다. 뭐가 먹고 싶다고 말하면 제가 미리 준비할 텐데 말이죠. 디테일이 없어서 그냥 있는 반찬에 밥 먹어야겠다고 여겼습니다.
아들은 얼마 전 제 생일에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그래서 밥 먹으러 오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밥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보냉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담아온 돼지고기 앞다릿살, 무우, 김치, 양파, 두부를 주섬주섬 꺼낸 후 싱크대를 여기저기 뒤적거리며 냄비를 꺼내고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뭘 만들 건데?"
"내가 만들 거니까 엄마는 쉬어."
"엄마는 쉬어."라는 말이 매우 낯설면서도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저에게 "쉬어도 된다"고 허락하는 순간, 뭔가 주객이 바뀐 느낌이라 어색하기도 했어요. 음식을 만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들이 만들려는 음식은 김치짜글이였어요. 7년 전쯤 아들이 집에 있는 재료로 요리해서 함께 먹었는데요. 그때 제가 맛있게 먹으며 식당 차려도 잘 팔리겠다고 요리사를 해보라고 말했어요. 그게 아들 뇌리에 남았나 봅니다. 그 생각이 나서 엄마에게 요리해 주고 싶었다고 해요. 갑자기, 왜죠?
생일을 못 챙겨준 미안한 마음도 깔려 있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편지 때문이었답니다. 5년 전 군대를 다녀와 삼수를 끝낸 시점의 아들에게 손 편지 3장을 줬습니다. 당시 아들이 그리 감동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했고, 그 편지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5년이 지나 우연히 편지를 읽은 아들에게 조금 울림이 있었나 봅니다. 내용을 까마득하게 잊었는데 다행히 브런치 글로 발행해 뒀기에 저도 복기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심을 담아 편지를 쓰기도 했고, 당시 출간할 《아이 키우며 일하는 엄마로 산다는 건》에 넣을 원고이기도 했어요. 책이 출간될 시점에 출판사에서 빼자고 해서 덩그러니 남겨졌지만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완전히 다른, 자유로운 영혼인 아들과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핸드폰에 '참을 인(忍)'자의 이미지를 배경 화면으로 깔아둘 만큼 아들과의 관계에서 인내가 바닥을 치고, 또 쳤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극에 달했다가 제가 항복했습니다. 잔소리해 봤자 변하는 게 없고 관계만 악화되었기에 모든 걸 포기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심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조금 다투어도 늘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체대 입시를 준비하며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금 철이 드는 듯하더니, 미적지근해졌습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좀 나아지려나 했지만 그렇지도 않았고요. 편지를 썼던 당시 삼수를 마치고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과 같은 책도 알려주고,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사주기도 했죠. 자격증 시험도 알려주고 지인에게 부탁해서 코칭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무작정 기다릴 뿐입니다.
이런 아들이 재료를 사 들고 저에게 찾아와, 제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김치짜글이를 만들어줬어요. 함께 맛있게 먹고 아들이 설거지까지 하고 갔는데요. 음식이 막 만들어졌을 때 조금 더 리액션 못한 게, 바로 사진도 안 찍은 게,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지도 않은 게 조금 아쉽네요. 저도 많이 당황했나 봅니다. 그래도 조금 변한 아들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지금처럼 차분히 기다려야겠죠.
"아들, 네가 만들어 준 김치짜글이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 뒷날도 데워 먹으며 네 생각했다. 고마워. 사랑해!"
'일과삶의 주간 성찰' 뉴스레터 주변에 소개하기 📣
오늘 글은 어떠셨나요? 피드백을 댓글로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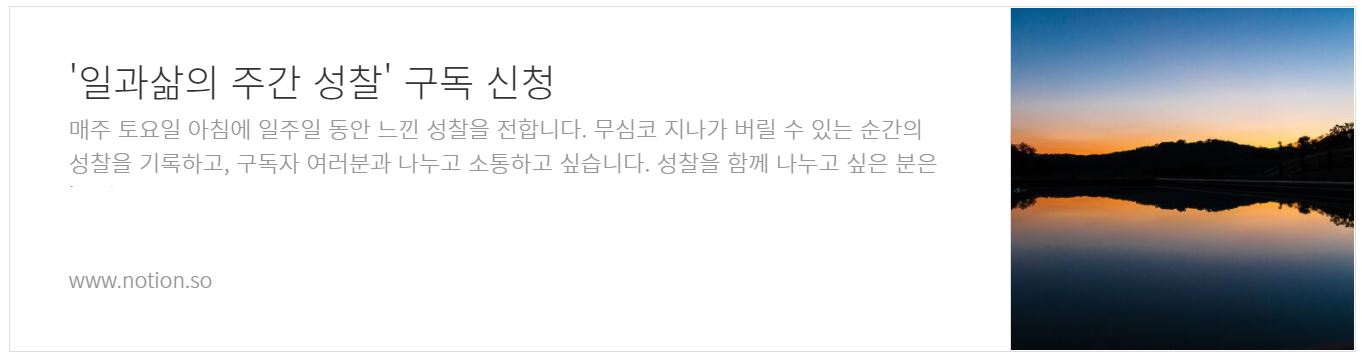
![[일과삶] 가을 자락에서, 배우고 즐기며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49f25is8ca2tptbyuw8gaszzty6x)
![[일과삶] 자원봉사와 기부에 전념하는 삶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wray9t1mb9fwcc442q0g2yjhr5iz)
![[일과삶] 주간 성찰 - 6월 결산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8t41g1tdl41mle040ubjmgadpjtp)
![[일과삶] 주간 성찰 - 8월 결산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dmg8h76i1nkflqy94txh14zzs085)
![[일과삶] 위키드가 부린 마법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kn3rw7jf6kk6ypec2apfmk5lobt1)
![[일과삶] 아보하? 나사하!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jsijjxzga6mklyd6pfho721ok7aj)
![[일과삶] 갓 구운 빵 냄새 좋아하세요?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j2pidn304z54204xxbyeex36vt09)
![[일과삶] 치즈 한 입, 추억 한 조각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u4o7939dyeqcwcm0heqtd0ldp131)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