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고은 작가와 김찬용 전시해설가가 『불타는 작품』을 매개로 '문학'과 '예술'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북토크 프로그램 '문화人터뷰_윤고은X김찬용'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두 작가를 잘 모르지만 인사이트를 얻을까 해서 신청했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요. 저의 은밀한 취미생활 중 하나입니다.
올 1월에 개관한 논현문화마루도서관은 강남문화원 건물에 있고 강의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1층 로비가 유용하더군요. 강의 전에는 창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강의 동안은 창을 닫았는데요. 강의 중간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구민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우리를 바라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윤고은 작가는 라디오 DJ이기도 해서 목소리도 청량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였습니다. 어느 순간 작가라는 근사한 모습에 반해 책을 향유하다 결국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부럽고 반하는 일로 자신이 좋아하는 걸 알아차립니다. 제 일이 그랬고, 글쓰기도 그랬습니다.
윤 작가는 일상에서 끌리는 것을 '만성질환'이라는 폴더에 넣어둔다고 합니다. 폴더명이 유쾌하죠? 그 폴더에서 개의 후원을 받는 예술가 이야기인 『불타는 작품』이 탄생했다네요. 예술과 관련한 작품이라 김찬용 도슨트에게 짬짬이 작품이나 콘셉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진행이 무척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김 도슨트는 우리나라 도슨트 1호라고 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자원봉사로 도슨트 활동을 한 선배들이 있지만 직업으로 도슨트를 선언한 최초의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네요. 어디선가 이분의 강의를 들은 기억이 가물가물 납니다. 자기 일을 좋아하는 전문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미술가와 예술가의 차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술가는 과거 방식으로 즐거움을 주는 이 시대 것을 다루는 사람이고, 예술가는 앞으로 나올 새로운 개념, 이 시대 이후의 것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뱅크시 같은 사람이 예술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 '코미디언(Comedian)'에 대한 행위예술가인 데이비드 다투나와 서울대 미학과 학생의 차이점을 언급했습니다.
도슨트이니 그림 보는 법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내가 이 작품에 끌렸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베르나르 뷔페전을 보며 어떤 작품이 끌리는지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봤습니다.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되었어요. 반면 작품보다는 인증샷에 열광하는 세태를 한탄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시관에서는 사진을 찍지 못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림을 감상하는 연령층이 넓어지고 즐기는 사람은 많아졌으나, 진짜 애호가는 줄어들었다는 말에도 공감합니다. 저는 애호가는 아니지만 그 근처에 가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김 도슨트는 아래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 예술가의 똥 (1961) 피에르 만초니
- 참나무 (1973)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 살아있는 누군가의 마음 속의 불가능한 물리적 죽음 (1991) 데미안 허스트
- 봄의 자장가 (2002) 데미안 허스트
- 나는 죽음의 신이요. 세상은 파괴자가 되었다 (2012) 데미안 허스트
- 무제/완벽한 연인 (1987-90)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미술관에서 홀로 하룻밤을 보내며 떠오르는 영감을 글로 써보라는 출판 기획자의 제안에 따라, 작가 리디 살베르가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과의 하룻밤을 수락하고 ‘피카소-자코메티’ 전이 열리고 있는 피카소 미술관에 들어가 쓴 책이 『저녁까지 걷기』입니다. 뮤진트리에서 펴낸 [미술관에서의 하룻밤] 시리즈 중 하나인데 몽땅 다 읽고 싶네요.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은 덴마크 루이지애나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보고 사진도 많이 찍었던 작품이라 반갑더군요.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 @덴마크 루이지애나 미술관](https://cdn.maily.so/5jlcw4s6qqrlp390q2q2l35w53if)
미술관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면 어떤 작품 앞에 머물고 싶은지의 질문에 김 도슨트는 의리를 강조하며 <무제/완벽한 연인>을 꼽았습니다. 동일한 장소 3곳에 똑같은 시계 2개를 비치하는 쿠바 출신 이민가인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작품인데요. 처음엔 동일한 시간으로 설정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곗바늘이 다른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결국, 보편적인 사랑이야기를 상징하는 일상이 예술이 되는 작품이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윤 작가에게는 도서관으로 바꿔 질문했는데요. 『깃털동물』, 『시간과 물에 대하여』와 같은 논픽션 과학 코너에 머물고 싶답니다. 읽고 싶은 책이 자꾸 쌓여만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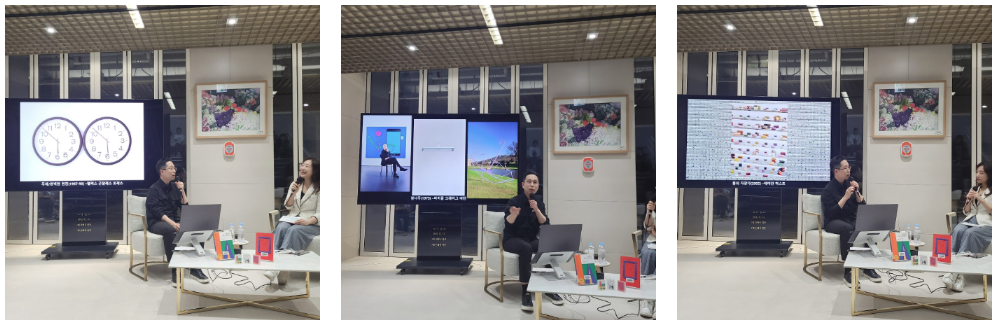
미술관에서 하룻밤이라고 하니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에서 소개한, 렘브란트 작품 <유대인 신부> 그림 앞에서 말라빠진 빵 조각이나 먹으면서 2주일 정도 앉아 있을 수만 있으면 자신의 명을 10년은 단축해도 좋을 것 같다던 빈센트 반 고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림은 잘 모르지만, 뭔가 위로를 주는 그림과 밤을 보내고 싶겠습니다. 렘브란트 작품 <유대인 신부>도 참 따뜻하군요. 빈센트 반 고흐, 베르나르 뷔페, 모네, 에드워드 호퍼, 데이비드 호크니 뭐든 좋죠. 정말 저자 페트릭브링리처럼 미술관의 경비원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서관이라면 에세이 코너에 가고 싶어요. 에세이에는 저자의 삶이 송두리째 담겨 있어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은 인생을 알 수 있어서 아직도 즐겨 읽으니까요. 밤새 여러 저자와 이야기 나누며 공간을 즐기는 거죠. 북스테이가 그런 개념이겠죠?
논현문화마루도서관에서 집으로 저녁 바람을 쐬며 찬찬히 걸어왔습니다. 작가와 도슨트가 말한 예술의 쓸모가 다른 가능성이거나 각성의 요소이거나 뭐든 좋습니다. 바람이 저를 감싸고, 예술과 문학에 조금만 다가갈 수 있다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한 여름밤입니다.
'일과삶의 주간 성찰' 뉴스레터 주변에 소개하기 📣
오늘 글은 어떠셨나요? 피드백을 댓글로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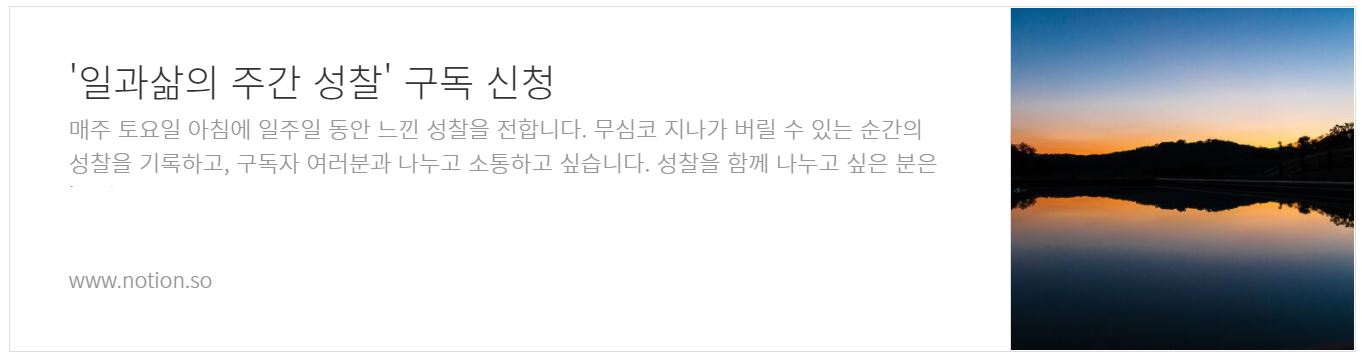
![[일과삶] 심리상담을 받습니다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t20ku3log4wqlnzgeviqjkx7qrl0)
![[일과삶]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kykyiozfy4ohuf7d4l2bp8cupspb)
![[일과삶] 주간 성찰 - 4월 결산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toqa12hgfgy8llic7loygw5gekly)
![[일과삶] 주간 성찰 - 6월 결산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8t41g1tdl41mle040ubjmgadpjtp)
![[일과삶] 주간 성찰 - 8월 결산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dmg8h76i1nkflqy94txh14zzs085)
![[일과삶] 자원봉사와 기부에 전념하는 삶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wray9t1mb9fwcc442q0g2yjhr5iz)
![[일과삶] 가을 자락에서, 배우고 즐기며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49f25is8ca2tptbyuw8gaszzty6x)
![[일과삶] 위키드가 부린 마법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kn3rw7jf6kk6ypec2apfmk5lobt1)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