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터도 창작자도
뉴스레터는 메일리에서
브랜드 마케터
구독자 그룹, 데이터 분석,
자동화로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개인 창작자
베이직은 월 1,000건 무료로
창작의 시작을 부담없게
검색 노출로 지속적인 성장
Google Lighthouse SEO 100점인 메일리는 검색엔진 최적화된 뉴스레터 블로그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통계와 데이터로 더
정확한 성과 측정
각 메일별 통계와 구독자별 통계를 활용하면 뉴스레터의 성과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GA, GTM 등의 외부 데이터 분석 도구를 연동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뉴스레터를
시작해보세요
🎉 새로운 뉴스레터
💌 추천 뉴스레터
🔥 인기있는 레터
새롭게 만나는 웰니스 레터, 잼플 레터

[웨비나 초청] 2025년 추경 확정! 신규 정부지원사업, AI로 정복하기

자작자작 업데이트 안내 선생님 마음 글쓰기

적층제조
— 정밀 제조의 미래, AI와 함께

구독자 님의 MPTI는? (오타 아님)

월간 코마콘 레터 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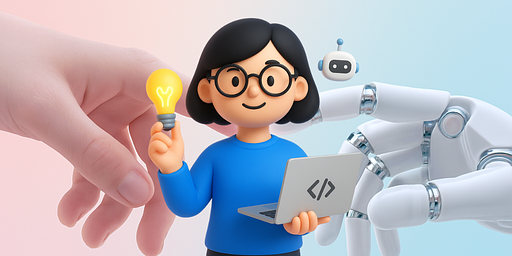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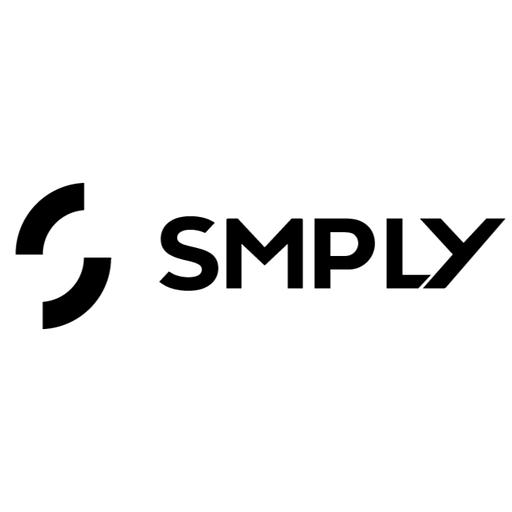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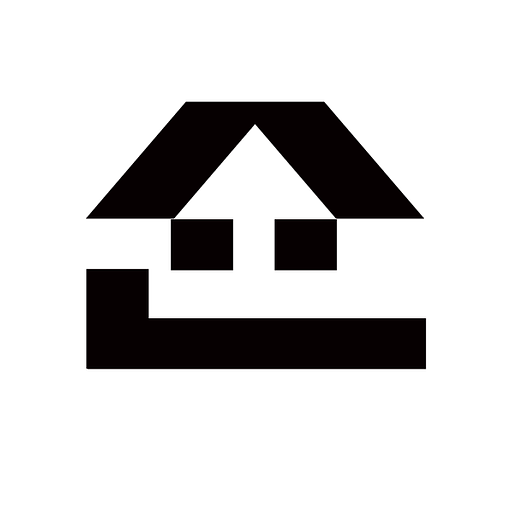


![[하스피] Tech 웹매거진 7월호 - Qualisys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h80gm3px2co01stuptk1wt11sdqy)



![[🌽콘.스.프] 구글 검색의 종말?! AI 시대의 검색 트렌드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507/1753719503963138.png)
![[#67.8월1주 비전레터] 오픈AI, 정답 대신 질문하는 '스터디 모드(Study Mode)'로 학습 혁신 선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508/1754199110125414.jpeg)
![[vol.119 | 뮤지컬&무용 편] 마녀와 마녀가 되려는 여자의 만남 外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f9z55dn6v0k87ahtl6j2zn6xmtps)



![[은호레터]샘 알트먼 “오픈AI, AI 인프라에 수조달러 투자” /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로블록스 주가 급락 / 하워드 막스 “매그니피센트 7 고평가 아냐" 등 오늘의 경제 뉴스 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508/175529801832444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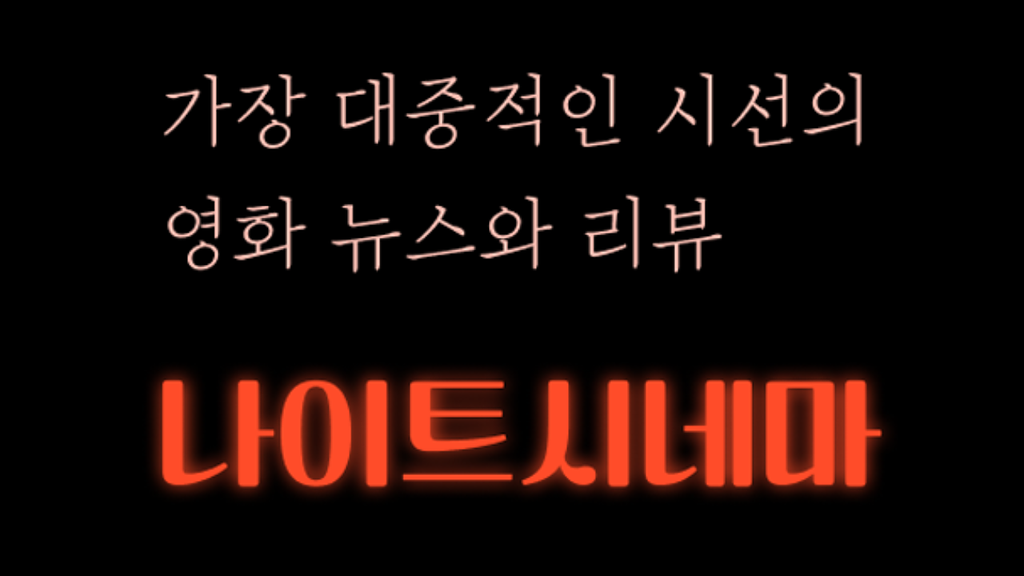
![[B-뉴스] 송철호 무죄 확정‥ 울산시장 선거 '요동' 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508/175527006783180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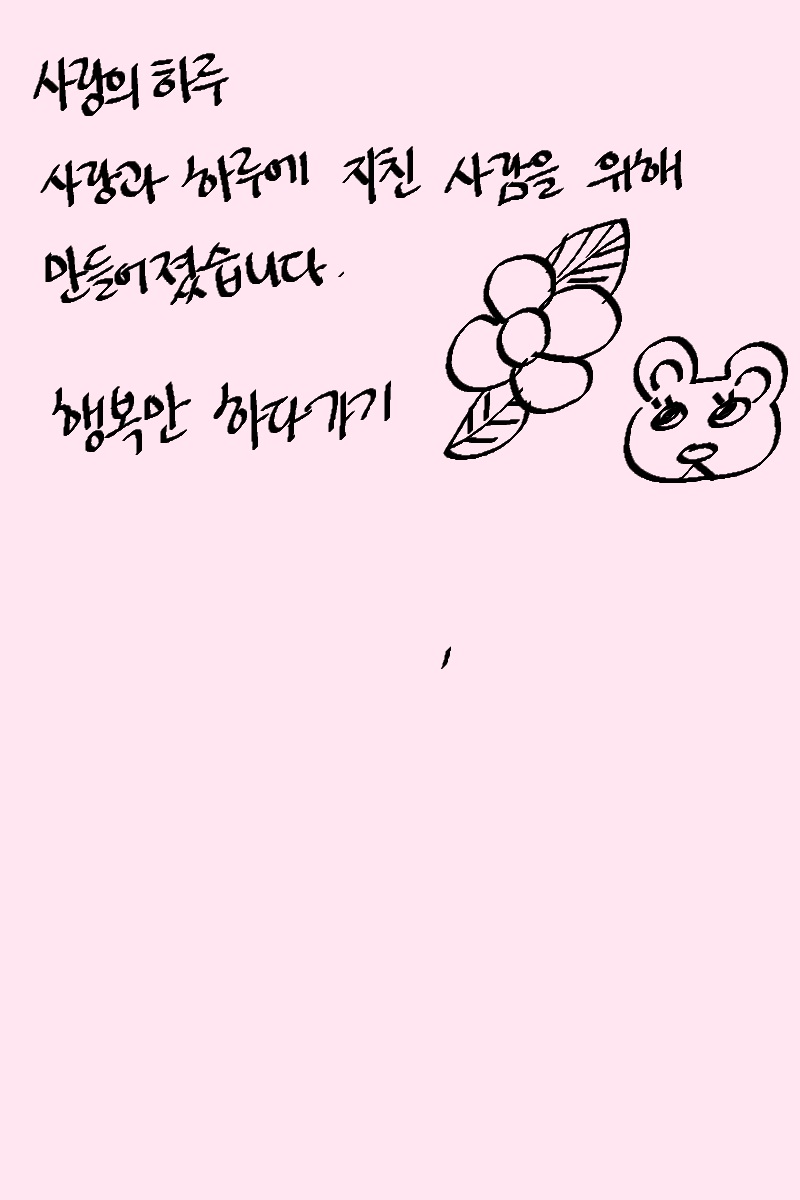

![[ 내 인생 구하기 ] 10화 작동하는 법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508/1755259135740209.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