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도 마케터도
뉴스레터는 메일리에서
개인 창작자
베이직은 월 1,000건 무료로
창작의 시작을 부담없게
브랜드 마케터
구독자 그룹, 데이터 분석,
자동화로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검색 노출로 지속적인 성장
Google Lighthouse SEO 100점인 메일리는 검색엔진 최적화된 뉴스레터 블로그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dd
통계와 데이터로 더
정확한 성과 측정
각 메일별 통계와 구독자별 통계를 활용하면 뉴스레터의 성과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GA, GTM 등의 외부 데이터 분석 도구를 연동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뉴스레터를
시작해보세요
🎉 새로운 메일러
첫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5명 이상의 구독자를 모으시는 경우 노출 됩니다.
🔥 인기있는 뉴스레터
'지속가능성 전문가 과정' 모집
🌏 EcoVadis X 에코나인 공동 개발 🌏

|
from.
econine
#포럼결과공유
[2025 정책포럼 결과 공유] '저성장 시대, 퀀텀점프 기업의 성공 방정식'
![[2025 정책포럼 결과 공유] '저성장 시대, 퀀텀점프 기업의 성공 방정식'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k2h6pgtxms0akeqpivl6x0896bwt)
from.
CEO스코어
👋 새로운 뉴스레터
최신순
주간 자유일꾼
|멤버십
[주간 자유일꾼] 만화 "램프의 책덕"
![[주간 자유일꾼] 만화 "램프의 책덕"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6d8eskp2bv78tm5simkhnzq51kvx)
from.
김민희
Elyot 💌 : 꼭 워라밸이 정답일까?
나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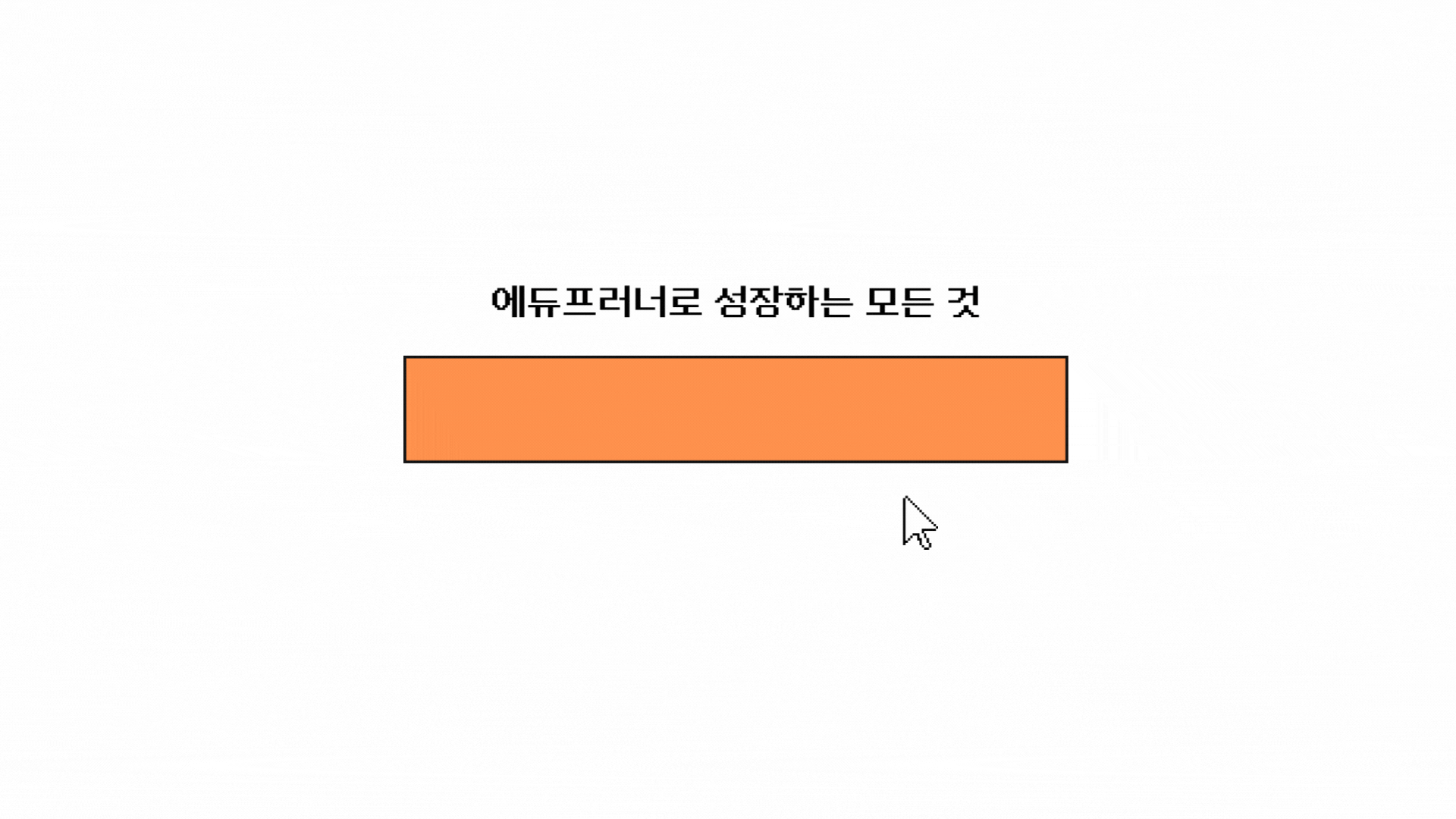
from.
엘리엇 Ely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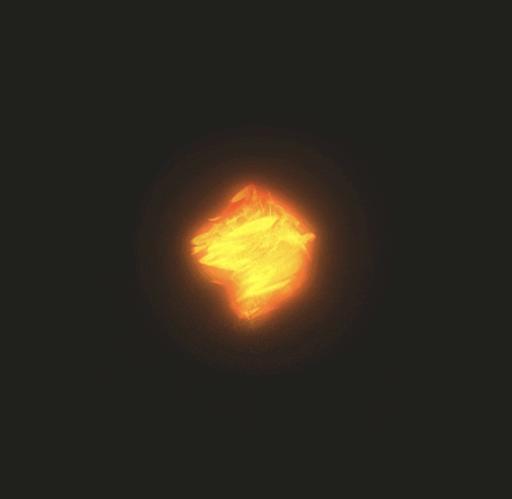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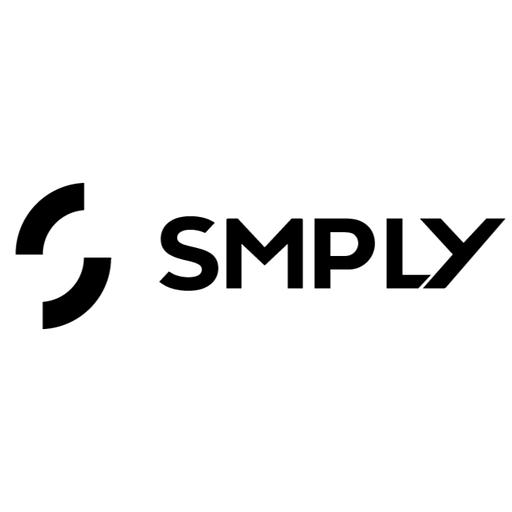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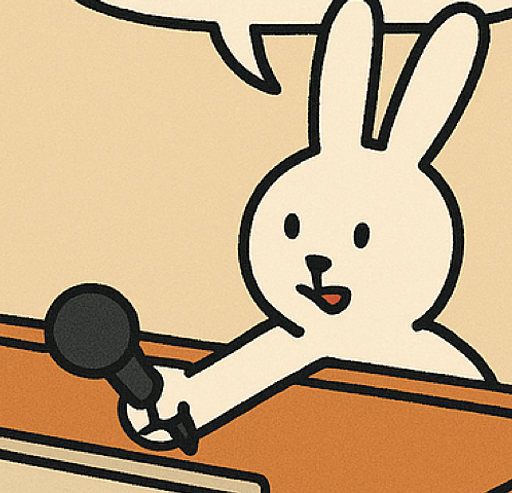





![[Trend A Word #399] 운명이 갈라놓은 안타까운 쌍둥이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505/1746706099002465.jpeg)

![🏗️[2탄]AM 표준, 왜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까?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505/1747333975769171.png)
![(광고)📡[응터뷰] '인플루언서 시딩' 경험으로 커리어 쌓는 비밀 🤫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1dhoudwqfjr1h04wkvasrhxmz0o4)
![📌 AI 실무자 100명이 몰린 'Real-World Enterprise AI' 컨퍼런스 현장! [비즈니스.AI]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504/174599240140445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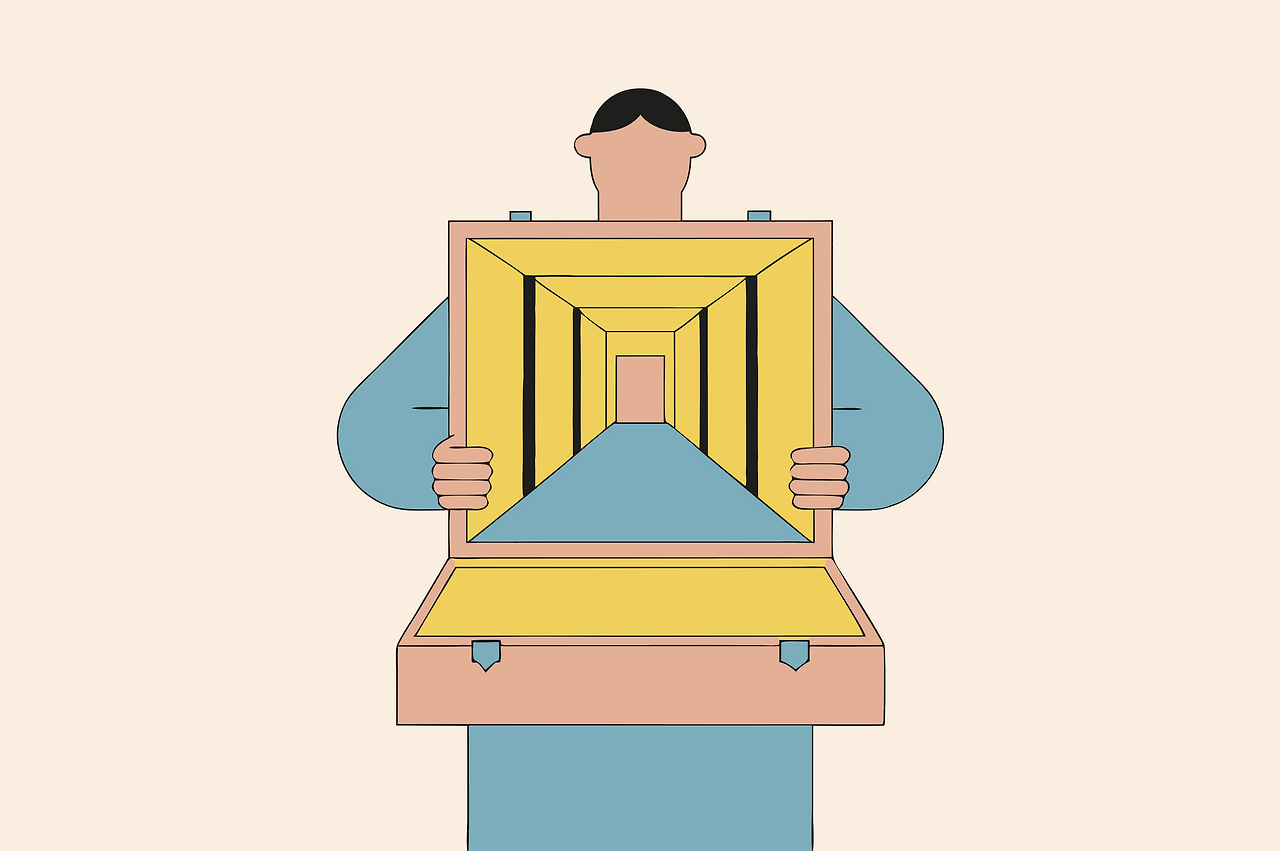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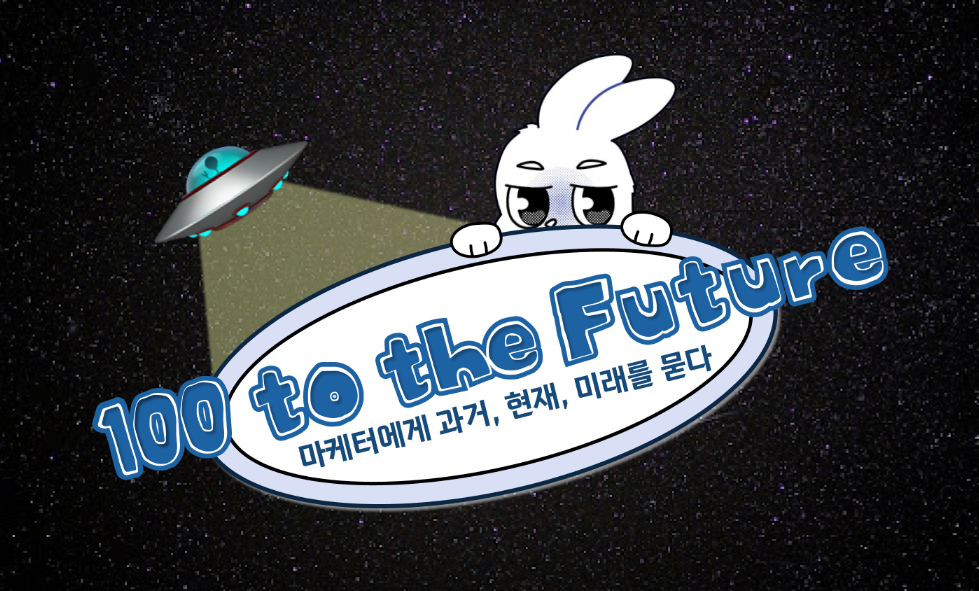


![[플레이오]🧠D60 ROAS 101%로 증명된 유저 중심 마케팅의 중요성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medl1wxrr0v2fs7dsbh6eufndb59)
![[🌤️시인이기33] 5월의 시 보냅니다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hzo1523erjcfnpsi2yzeyjg9tf69)

![[Trend A Word #404] 엄마가 모르셔서 그렇지 요즘은 다들 트워드 구독해요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505/1748346801572015.jpeg)



![[은호레터]데일리 차트팩 - ‘스텔스 베어마켓’과 시장 내부 균열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1gllnvua52b8d20yuef1pjg3kkze)
![[은호레터]오클로(Oklo), 원자력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실리콘밸리식 혁신이 바꿀 에너지 판도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505/1748236041409402.png)
![[번역] 카도카와: 전 세계 팬들을 하나로 잇는 스토리의 힘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c1cm5wqf3rrdljf110upox517p2a)

